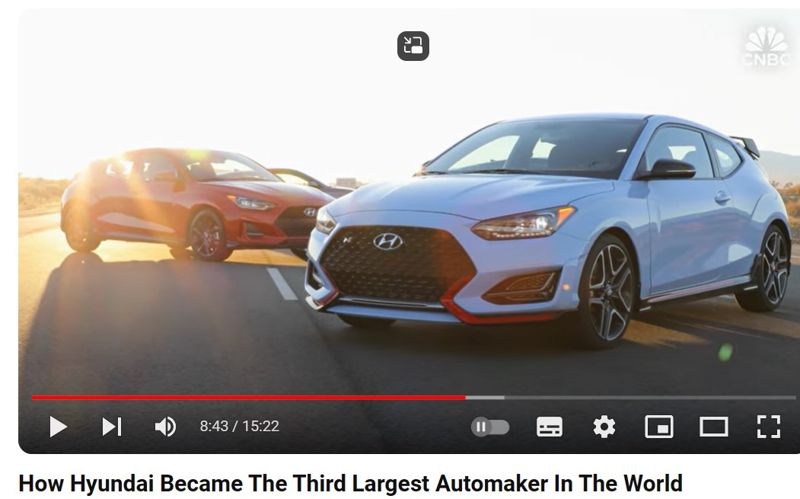美 주요 언론, 현대차 성장사 주목
품질경영에 대한 진심 소비자들에게 통해
전기차 등 모빌리티 분야 적극적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성공 비결을 조명한 CNBC 보도. 유튜브 캡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은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동차 기업이 됐나?'
미국 최대 경제전문 방송사 CNBC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런 제목으로 세계시장 판매 3위(미국시장 4위)로 부상한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집중 조명하는 15분짜리 방송리포트를 내보냈다.
CNBC는 현대차그룹이 세계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수상을 거듭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제조사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선두권 업체와의 간극을 좁히고 있으며,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다른 경쟁 업체들이 포기하고 있는 영역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기차 판매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현대차의 미국 시장 진출 초기도 다뤘다.
도요타가 구축해 놓은 아시아 브랜드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이뤘으나, 일본 브랜드보다 쳐진다는 평가를 받는 등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게 '품질경영'이었고, 품질에 대한 '진심'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회장 시절인 1999년 품질 확보에 대한 배수의 진으로 '10년간 10만 마일 무상보증'이란 파격적인 제도를 선보인 바 있다.
CNBC에 연세대 이무원 교수가 현대차그룹의 성장사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 유튜브 캡쳐
연세대 이무원 교수는 CNBC에 현대차 성장의 변곡점을 2000년대 초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00년대 초 이미 현대차의 품질 수준이 미국의 빅3,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섰었다"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품질경영을 기치로, 미국 진출 15년 만에 고속성장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경쟁업체들의 모범 사례를 차용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실행했으며, 품질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0년대부터 경쟁업체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윌리엄 바넷 교수도 CNBC에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입했을 당시(1986년·포니엑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날 그들이 성장한 모습은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바넷 교수와 이 교수는 지난 2022년 말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케이스센터에 공식 등재된'현대차그룹: 패스트 팔로워에서 게임 체인저로'의 공동저자다.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업체 오토퍼시픽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드 킴은 CNBC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도요타의 동급 모델인 bz4x에 비해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의 애널리스트 샘 아부엘사미드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가장 선도적인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E-GMP 기반의 전기차 및 향후 출시 예정인 모델들도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CNBC는 현대차그룹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지속 개발하면서 넥쏘, N 비전 74 등 혁신적 모델을 선보였고, 자율주행, 온라인 차량 판매 등 도전과 혁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자동차 업계 리더로서 시장을 개척 중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월스트리트저널이 게재한 '현대차,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졌나'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 이미지. 월스트리트저널 캡쳐
미국 주력 언론에 현대차가 집중 조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5월 '현대차,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졌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의 빠른 의사결정과 조직 내부의 실행력, 디자인 중심 경영, 적극적 해외 인재 확보 등을 주목했다. 블룸버그와 뉴스위크도 각각 '현대차, 도요타와 폭스바겐 겨냥', '10년만에 바뀐 현대차의 위상' 등의 제목으로 현대차의 성장을 주목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의 이런 보도는 현대차의 성장을 방증할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브랜드 파워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