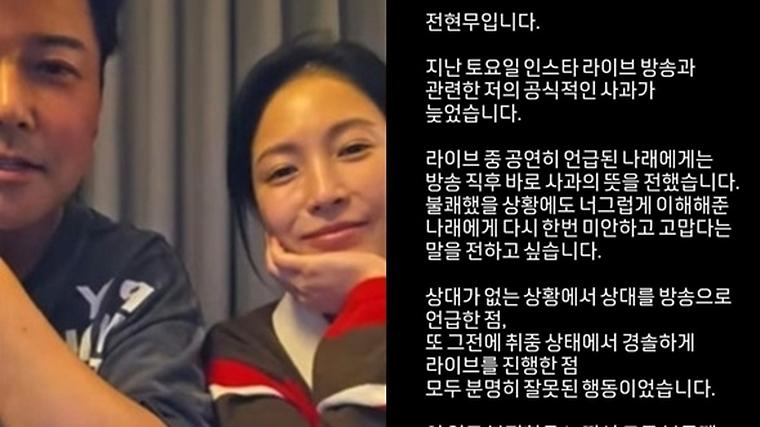"노벨상은 중요한 연구를 하겠다는 과학자의 의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주위의 지원이 만든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신희섭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단장은 14일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처음부터 상을 보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 자연히 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일단 과학자들은 과학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 단장은 "배가 고프다고 씨감자를 먹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초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 단장은 지난 2005년 뇌의 작용에 대한 유전학적인 연구에서 큰 업적을 이룬 것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세포의 칼슘 이온통로 연구를 통해 뇌의 '의식-무의식 상태'를 조절하는 핵심 기전을 규명해 수면조절, 간질, 통증치료의 가능성을 찾아냈다.
이후 IBS가 출범한 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을 이끌면서 뇌 시상의 제어 원리와 사회적 행동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신 단장에게 IBS의 현주소,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노벨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생쥐를 활용한 자폐증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다.
―연구분야에 대해 소개한다면.
▲연구센터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다. 뇌 인지기능에 대한 기전, 결국 행동의 뇌 기전 동물의 행동이 뇌기능의 산물이다. 사회성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상자에 망을 쳐놓고 쥐를 넣는데 반대편에는 칸막이를 해 놓고 한 쪽에는 공을, 다른 쪽에는 쥐를 넣어놓는다. 실험대상인 쥐가 어느 쪽을 향해 움직이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 쥐는 결국 생쥐 쪽으로 가서 관심을 보인다. 그게 바로 '사회성'이다. 이것이 파괴되면 자폐증을 보이는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는 수백개도 넘는다.
―다양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처음 이 분야를 택했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돌연변이 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든다. 연구비 문제가 가장 크다. 다행히 1992년에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과학기술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의 선도기술개발사업인 G7 프로젝트가 생겼다. 이 때문에 3년 과제, 6년 과제로 연구기간이 늘어나고 매년 900만원에 불과했던 연구비도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돌연변이 생쥐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후 창의 과제, 국가과학제도 등이 생기면서 대폭 늘어났다. 필수적인 지원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수준도 높아졌다. 연구의 질이 좋아지고 서서히 성과도 성장 커브를 그리고 있다. 지난 30여년간의 변화다. 연구비 지원 증가와 연구수준이 나란히 간다. 결국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했느냐에 따른 결과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뭔가 해보려는 의욕 넘치는 연구자가 많다.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욕 넘치는 과학자와 국가의 지원이 보태지면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지원을 받았다는 건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연구 주제가 흥미로워서인가.
▲주제라는 게 구체적인 하나의 실험, 해결해야 하는 연구대상일 뿐이다. 자폐증은 그나마 큰 문제로 분류된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달려드는 분야에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달려드는 것이다. 관심분야가 심장병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연구 인력이 몰린다. 결국 누가 먼저 흥미있는 것을 발견하는가를 경쟁하는 것이다. 연구주제가 중요하냐 아니냐를 구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다. 특히 서양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당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기도 한다. 또 중요 연구분야는 약을 개발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에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고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유용성을 따지기도 한다. 반면 사회경제적 유용성과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탐구 과제인 천문, 암흑물질 등 기초 과학원리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다. 하지만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분야를 누군가 하려고 할 때는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과학계에서 IBS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나.
▲IBS가 생긴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가 형평성이다. 그것이 깨지면 찾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IBS는 형평성과 동떨어져 일부 과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연구자들 중에는 '국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당장 내 밥벌이도 해결이 안되는데라는 심리가 있다. 그래도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하는 IBS 같은 곳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IBS와 같은 기관이 처음에 생각한대로 이끌어가고 유지해가려면 나라 경제가 좋아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걱정이 많다. '굶어도 씨감자를 안먹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연구인력부터 다 잘랐다. 오히려 어려운 때 장기적으로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먹을거리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게 과학을 바탕으로 문·이과 구분없이 과학소양을 키우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고시부문에 과학과목을 추가하면 어떨까 한다. 논리력을 보기 위한 것이다.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귀납적, 연역적으로 공통적인 논리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현상을 보면서도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조세 문제도 과학과목을 적용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가업을 대대로 물려가면서 기술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한다. 그 기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초밥이나 술을 만드는 장인들은 할아버지 대부터 내려온 전통을 배운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필요하다. 과거 사회에서 장인, 전문가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없었다. 최고의 도공은 왕에게만 소속되고 시장에 나갈 수가 없었다. 기술자들은 중인 계급으로 하대받았다. 지금도 그렇다.
문과, 이과를 나눈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 과학적인 사고 없으니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논리적으로 답할 수가 없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과학계에 발을 들인 이상 노벨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법도 한 것 같다.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 연구자가 처음부터 노벨상을 타려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이 재미있으니까 더 연구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를 연구하려는 자세다. 미국 어느 과학자는 자기 동료가 그 분야에서 노벨상을 타자 바로 분야를 바꾸기도 했다. 연구분야가 겹쳐서다.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주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학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젊은 과학자에게는 헝그리정신이 필요하다. 원로 과학자들이 모이면 요즘 젊은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해서 뭔가 한번 일을 내 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일례로 IBS는 젊은 과학자에게 5년간 무조건 지원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방대에 자리가 생기면 가버린다.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다. 직업인으로서 과학자를 한다는 것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 스스로도 연구를 통해 끝을 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약력 △65세 △서울대 의과대학 학·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유전학 박사 △MIT 생물학과 조교수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소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 소장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단장
■수상 경력 △호암상 과학상 △듀폰과학기술상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제1호 국가과학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