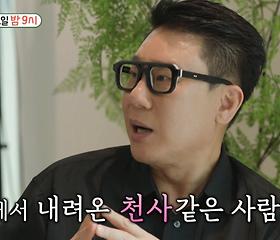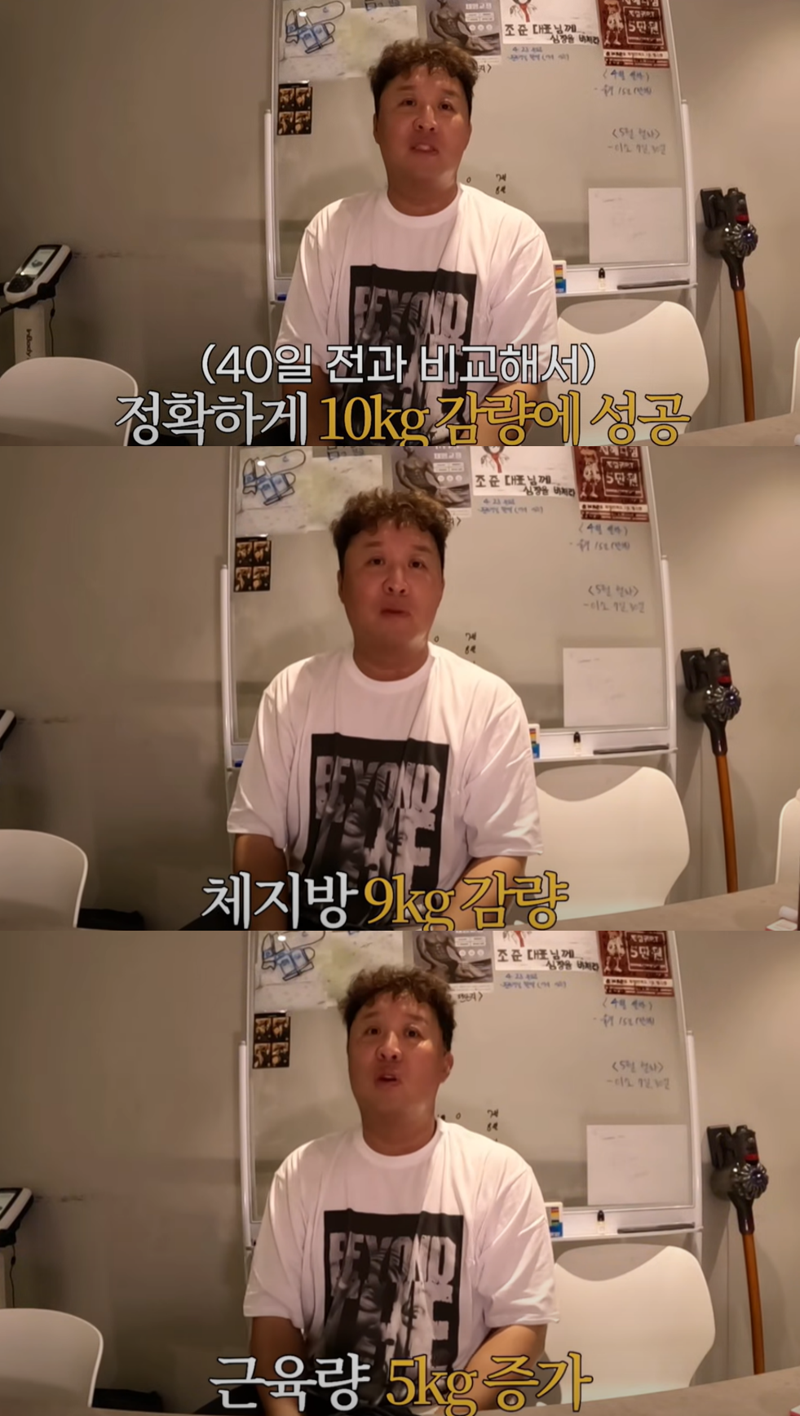박상인 서울대 교수 "자구노력으로 극복 못하면 법정관리 절차 돌입해야"
국책은행이 대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지금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탈피해 시장주도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구조조정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공동 컨퍼런스에서 "구조조정 기업들이 국책은행을 통한 추가적 자금지원 없이 자구노력으로 유동성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는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진원지를 국책은행으로 꼽았다.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24%를 국책은행이 차지하면서 부실기업의 존속을 지속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과 회사채 매입의 대부분을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충당하면서 시장도 '국책은행 지원=공적자금 투입'으로 해석하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더라도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기업의 신용위험도는 B등급으로 평가되고 채권은행들도 이들 기업의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해 왔다는 지적이다.
결국 현행 구조조정 절차가 국책은행과 공기업 경영진,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와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주도적인 구조조정은 기업부실의 책임을 국민, 채권은행, 주주의 순으로 지우게 된다는 것.
박 교수는 "부실 징후가 큰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이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했고 상업은행이 동참할 수 없을 때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면서 "주주들의 책임을 국책은행이 메워주고 정부가 사실상 공적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기능을 없애고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더라도 기존 기업을 청산하고 청산기업의 자산과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기업에 출자할 경우에 평가와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조조정을 담당해왔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이를 담당할 청산 및 회생 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