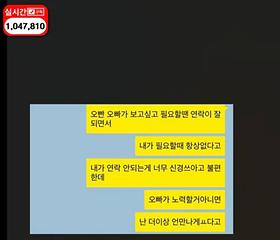![[여의나루]국가는 왜 실패하는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04/19/201804191712492665_s.jpg)
발전론의 세계적 석학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빈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리적 위치나 질병, 문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제도와 정치라고 했다. 특히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번영을 다지는 열쇠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당연 독재나 권위주의가 아닌 다원주의적 정치권력과 사회계층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정치 시스템을 말한다. 근대국가에서 위로부터 혁명이 실패의 연속이었던 이유도 혁명세력이 다원주의적 포용성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또 다른 배타적 권위주의가 됐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정치 시스템하에서는 하나의 지배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만이 '선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 반대의 가치는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된다.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은 자율과 인센티브보다는 주로 개입과 규제를 통해 경제를 운용하려 한다. 그런 체제에서는 포용적 경제뿐만 아니라 창조적 파괴도 불가능하다. 기업이든 정부든 미리 정해진 가치기준과 준칙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제재와 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정동 교수가 '축적의 시간'에서 말한 '실패에 대한 관용'이 없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노동을 포함한 각 부문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보면 자율과 책임보다는 과다한 개입과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다. 노동부문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심지어 근무방식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한다. 노사의 자율협상 영역까지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싶어한다. 이해상충 상대가 있는 협상 그라운드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 노릇을 하는 대신 어느 한편을 '선하지 못한' 플레이어로 미리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개입과 규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형평의 가치만 강조하고 자율과 경쟁에 의한 효율의 가치를 아예 무시하게 되면 두 가지 모두를 잃게 된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되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청년일자리 위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면 할수록 제도 경직성은 높아지고,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은 낮아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다. 경제 후진국일수록 규제가 많고 인센티브는 적은 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규제는 적고 인센티브 시스템은 정교하고 공평하게 발전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사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일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새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 오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역대 최고, 일자리 증가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창출에 역효과를 내는 규제정책만 계속하는 한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의 투자심리는 갈수록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을 국민이 다시 볼 기회는 더 멀어질 것이다.
방하남 국민대학교 석좌교수·전 고용노동부 장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