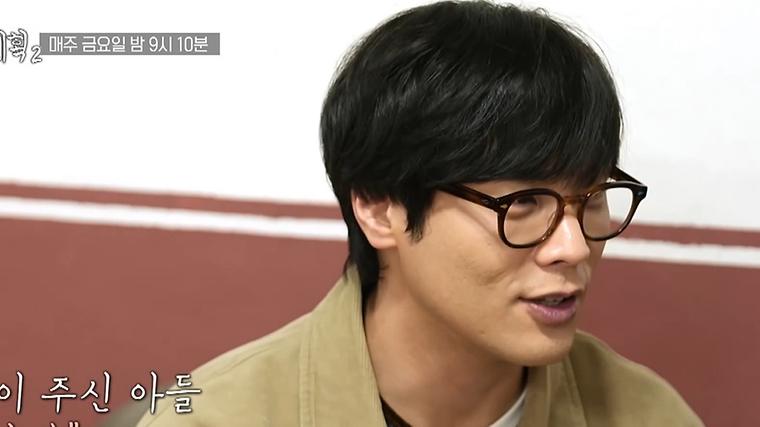미국 환경청(EPA)이 2032년까지는 판매되는 신차의 최대 67%가 전기차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 행정부 사상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자동차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 CNBC 등에 따르면 마이클 리건 환경청장이 12일 미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리건 환경청장이 1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새 배출가스 제한 규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미국에서 팔리는 신차의 54~60%는 전기차여야 한다.
전기차 비중이 급격히 확대돼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미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2%에 그쳤고,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고는 해도 고작 5.8%에 불과했다.
이는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2030년까지 신차의 약 절반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보다도 더 적극적인 계획이다.
EPA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것처럼 EPA는 배출가스 제로의 미래 교통수단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사람들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새 기준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부처간 검토 과정이 마무리되면 이 제안서가 날인돼 연방관보에 실리고, 대중의 검토와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그러나 새 배출가스 기준과 이에따른 전기차 비중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전기차 전환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통해 강제로 전기차 전환 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리비안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공급망 차질과 수요 부진 전망 속에 생산확대에 고전하는 등 전기차 생산확대가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의 야심찬 전기화 계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 최대 관건 가운데 하나인 충전소 확대 역시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문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의 주유소처럼 흔하게 보여야 전기차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2월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차지포인트 등 전기차 충전소망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이를 개방형으로 운용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내놓은 바 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 충전만 허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충전소 개방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 주변을 포함해 최소 50만개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테슬라가 2일 1·4분기 출하통계에서 입증했듯 전기차는 생산확대 자체의 어려움에 더해 여전히 고가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가격을 낮추고는 있다지만 대규모 가격 인하가 없으면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기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테슬라가 올해 가격인하에 나서고 있고, 6일에도 추가 인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 가장 싼 보급형인 세단 모델3는 1000달러 값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4만2000달러(약 5540만원)로 중형차 값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