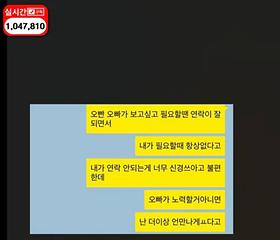삼성 300조 투자할 용인 클러스터
야당은 "재생에너지로 하라" 딴죽
SK하이닉스도 지자체가 제동
유럽 등 경쟁국 대비 지원책 부족
![불황에도 반도체 420조 투자하는데… 정치권 몽니에 발목 [K반도체 멀어지는 상저하고 (下)]](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10/03/202310031829352229_l.jpg)
국내 반도체 업계가 내년 반도체 업턴(상승국면)에 대비해 공격적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투자를 독려해야 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중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등 경쟁국가들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과감한 세제지원과 규제 해소 없이는 K반도체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규모 투자 발목 잡는 정치권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반도체 침체기에도 사상 최대 투자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8조94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 기간 역대 최대인 25조3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단행했다. 이 중 91%가 넘는 23조2473억원을 반도체 부문에 집중 투입했다.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 행보와 달리 정치권과 지자체는 좀처럼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에 지을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인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야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전력소모량이 많은 반도체공장 특성상 클러스터 초기 가동 전력공급을 위해 6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산업단지 안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계획을 새로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는 반도체공장 특성상 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려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사업은 지자체의 몽니로 단지 조성이 수개월간 늦춰졌다. 여주시가 '물값'에 상응하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용수 공급시설 인허가를 기약 없이 미루면서다. 민주당은 초과이익분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횡재세'를 삼성전자에 부과하기로 하는 법안을 발의(양경숙 의원)하는 등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기업 특혜 감세'라며 비난하고 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어렵게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며 "국내 지원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아 산업단지 인프라가 제때 갖춰질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력공급·해외기업 유치 대책 시급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공급 대책도 국내 반도체 업계 반등의 취약점이다.
EU는 역내 생산역량 확대를 위한 33억유로(약 4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반도체법인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숙련된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재양성에 2억유로가량의 투자를 쏟아 반도체 관련 대학원 과정, 인턴십 등 반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기업인 인피니언이 있는 독일 의회는 지난 6월 비EU 근로자도 최대 1년간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주노동자 유치법'을 통과시키는 등 이민제도를 손보면서까지 첨단산업 인재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최근 통과된 K칩스법에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제외되는 등 세제지원뿐 아니라 인력, 기반시설 규제완화도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 해소에 나서줘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향후 급증하는 생산역량에 대비해 혁신인재 공급은 부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인력 확보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기업 국내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 마이크론, 대만 TSMC가 일본에 세운 반도체공장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며 반도체산업 재건을 노리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일본·유럽은 외국기업을 자국 내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국내는 이 같은 지원책이 부족하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약점으로 꼽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가까이 있을 때 반도체 공급망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