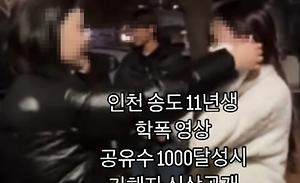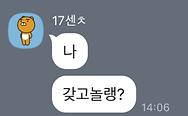이는 일명 ‘기침 심폐소생술’로 불리는 잘못된 의학정보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노태호 교수는 “이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중한 초기 수분을 허비하는 방법으로, 트위터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의학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제공한 의학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SNS를 통한 잘못된 의료정보의 전달은 SNS가 발달한 미국에서 이슈화된 바 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미 정부의 공식 발표 전 트위터를 통해 ‘생화학 테러전이다’ ‘수천명의 시체가 스페인 독감 때 쌓였다고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퍼지는 바람에 젊은 층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SNS에 올린 글은 포털사이트와 달리 걸러내기가 힘들고 돌려보기(RT)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 올해 4월 미국질병통제저널에 실린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대니얼 스캘필드, 일레인 라슨 박사팀 논문에 따르면 ‘감기+항생제’의 내용으로 302건의 글이 업데이트됐을 때 85만375명의 팔로어가 잘못된 상식을 접했다. ‘독감+항생제’의 글은 345건이 업데이트됐고 17만2571명의 팔로어가 잘못된 상식을 접했다.
실제 독감의 경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 인해 항생제를 더 구해 먹겠다는 남용사례와 가지고 있는 항생제를 나눠주겠다는 반응이 23만16명의 팔로어에게 나타났다.
반면 SNS와 같은 인터넷 게시글이라도 포털사이트는 자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NHN 원윤식 부장은 “포털사이트는 게시자나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제재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검토 후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요청일 경우 당사 운영원칙에 의거해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NS의 경우 잘못된 상식 유포 확산 방지를 비롯한 지도감독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는 “일반인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건강정보를 트위터를 통해 전달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의료진도 하나의 질환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정보를 선택해 주는 코디네이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 김태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