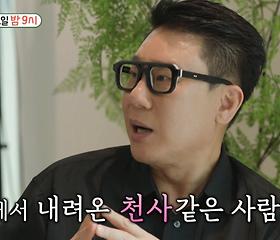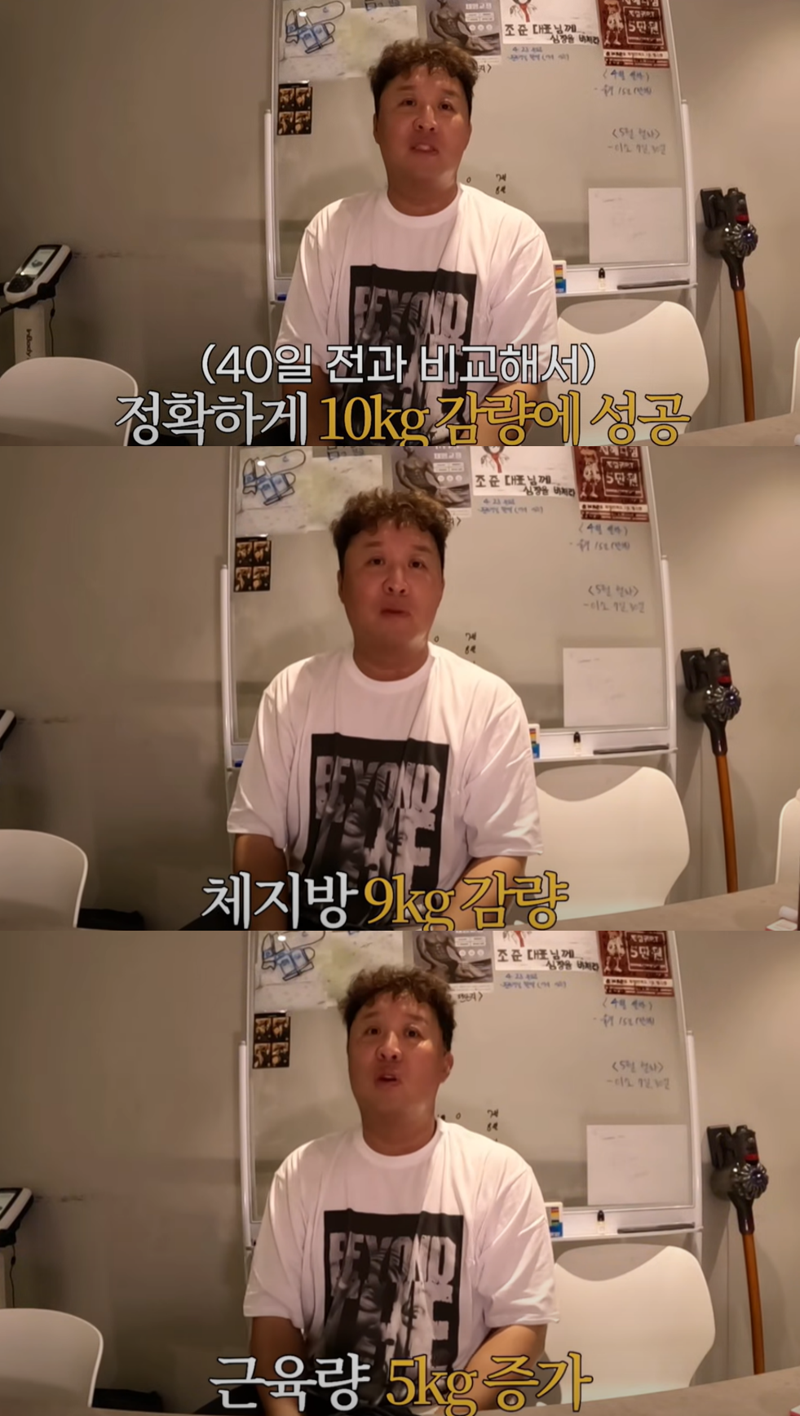사례1. 경남 마산의 김씨(32)는 2002년 월 50만원의 A생명의 N보험에 가입했다. 처음 몇 달 동안 설계사가 방문해 보험료를 수금해 갔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김씨가 직접 회사를 찾아 납입을 하면서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설계사가 수금해 갔던 몇 달치가 정상 입금된 것이 아니고 적립금에서 이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료가 미납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사례2. 인천의 서씨는 2004년 B생명에 월 200만원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주식시장이 좋아 의무납입이 끝나고 3년만 기다리면 원금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해약환급금이 예전보다 줄어 있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기납입된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계속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는 그동안 그러한 사실을 안내받은 적도 없어 보험사에 이의제기했지만 처리불가 안내를 받았다.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제도’를 사용할 경우 잘못하면 해약 환급금이 0원으로 속칭 깡통보험이 돼 강제 해지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6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이란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기존 적립금이 월 보험료로 대체납입돼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 등에 있는 기능이다.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체납입이 이뤄진다.하지만 문제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빼간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미납 사실을 모르고 계속 기간이 지나면 결국 적립금이 바닥나 해약 환급금이 ‘0원’인 ‘깡통보험’이 돼 원치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약된다.
특히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이를 노리고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입금하지 않은 채 가로채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대체납입 제도가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투자형이 많아 보험료가 고액이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보소연 관계자는 “대체납입이 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내면 꼭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