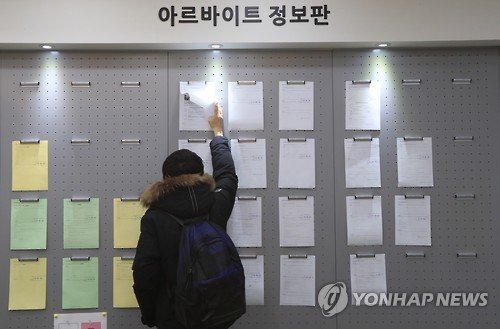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청년들은 편의점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다수에겐 정규직 일자리를 위해 거쳐 가는 단계다. 그러나 알바만 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 청년 프리터들도 등장하고 있다.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생계형 프리터 족(族)이 늘고 개인주의 문화세대가 나타난 것이다.
프리터는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 합성어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알바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1980년대 말 일본에서 비롯된 용어로, 이후 일본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0년부터 정규직을 갖지 못해 알바하는 청년이라는 뜻도 포함됐다.
■‘사생활’ 중시 日 프리터와 달리 한국은 ‘생계형’
김현정씨(가명·26·여)는 서울 모 전문대 중국어과 졸업 후 3년째 알바만 한다. 프랜차이즈 체인점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한다. 지난해 월 130만원을 벌었지만 올해 최저시급(7530원)이 오르며 월 157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현정씨는 만족하면서도 착잡하다. 그는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이제 어쩔 수 없다”며 “1년 취직준비하다 포기했다. 자취를 위해 알바를 하다 이대로 눌러앉았다”고 말했다. 현정씨는 월 주거비와 생활비로 80만원을 쓴다. 가족에게 도움 받을 형편이 아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텐트 안에서 자면서도 피아노 학원비로 10만원을 쓴다. 현정씨는 “오후 3시 퇴근해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는 게 행복하다”면서도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건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포털 알바몬이 성인 알바생 1053명을 대상으로 ‘프리터’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6%가 자신을 프리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년도 같은 조사에서 31.8%였던 점을 감안하면 25%p나 증가한 것이다. 프리터 중 과반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비자발적(55.8%)’으로 프리터 생활을 한다고 전했다.
프리터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청년 구직난이 꼽힌다.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계로 시작한 알바가 취업준비 능력을 약화시켜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본 프리터가 사생활을 중시하는 점이 원인인 것과 달리 한국 프리터 대다수는 생계형”이라며 “정규직 취업문이 좁아 알바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취업준비자 중 알바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와 정책지원방안’에 따르면 취업준비자 중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 취업자는 2016년 기준 10만4855명이다. 2014년(5만7551명), 2015년(9만5485명)보다 급격히 늘어났다.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취업준비자의 평균 취업준비기간이 15개월, 생활비용(주거비) 월 50만원, 취업준비비용(학원비) 월 34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알바를 하다 취업준비가 길어지고 정규직을 포기한 뒤 어쩔 수 없이 프리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편의점 알바가 어때서...직업보다 내 생활 우선
2016년 일본 권위의 문학상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은 소설 '편의점 인간'이었다. 저자 무라타 사야카는 18년간 편의점 알바로 일했다. 그는 소설에서 “30대 중반인데 왜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가”를 묻는다며 ‘사회규격에 맞추지 않는 삶을 간섭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프리터는 필연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 알바는 해고가 쉬워 일자리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업무 능력이 축적되지 않아 노후는 불안정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프리터 역시 일본처럼 개인주의 풍조 확산으로 정규직 기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더구나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다양한 알바 직종에 참여하는 프리터족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된다.
고강섭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프리터족도 일본화되고 있다”며 “아버지 세대와 달리 청년들은 평생직장보다 본인이 가치를 느끼는 역할을 찾아 직업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시간제 임금이 오르고 1인가구 등 개인생활양식이 보편화되면서 스스로 가치와 목적을 중시되는 문화 속에 프리터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유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