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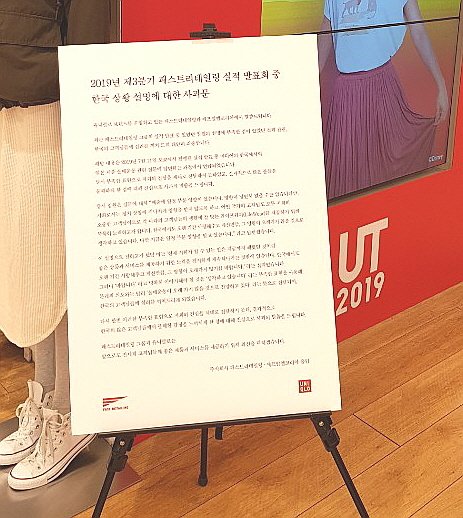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불매운동을 결정한 한국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유니클로 명동중앙점 찾은 미국인 관광객 케이틀린 스미스)
국내 최대 규모 유니클로 매장에는 '한국'이 없었다.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유니클로 명동중앙점 1층 고객 수는 10여명이었다. 이 중 8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미국인·중국인·인도네시아인·아르헨티나인·캄보디아인 등이었다. 드물게 보이던 한국인 고객은 정작 구매는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명동중앙점은 총 면적 3966㎡(1200평·4개층)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유니클로 직영매장이다. 지난 2011년 11월 첫 영업날 20억원의 하루 매출 '신기록'을 썼다. 유명 제품 출시 날엔 수백 명이 이곳 문 앞에서 줄을 서던 것이 일상화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매장 안이 급격하게 한산해졌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여파로 매출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택배노동자들도 불매운동에 합류…장기화 조짐 보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촉발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유니클로 임원의 발언은 기름을 부었다. 유니클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두 차례 사과했으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택배 노동자들은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를 선언했다.
명동중앙점 출입구 쪽에 배치된 '사과문'을 읽는 한국인 고객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매장 안엔 외국인들만 있는 것 같았다. 미국인 관광객 케이틀린 스미스(여·22)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논란에 대해 알게 됐다"며 "불매운동으로 확산한 것을 보니 한국인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며 이 권리는 때론 단체 행동으로 나타난다"며 "한국인의 불매 운동은 그들의 권리로서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관광객 알레한드로 마틴(59)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개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그는 후드티를 포함한 유니클로 의류 10여 벌이 담긴 쇼핑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마틴은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제품 질도 나쁘지 않아 이번 기회에 쇼핑을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불매운동이 크게 일어나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국가 기업은 공격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유니클로는 분명 한국인의 거센 불매운동 흐름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도네시아인 남성(20)은 "유니클로 외에도 괜찮은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있으니 한국인들이 불매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한국 방문 직전 일본 여행을 했다는 그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며 "양국은 그야말로 가깝고도 먼 나라인 듯 싶다"는 생각을 털어놨다.
◇"불매운동 끝나기 전까지 제품 구입 힘들 것 같다"
매장에는 '기간 한정 가격' 등 할인행사를 알리는 문구가 가득했다. 유니클로 대표 여름 상품군인 '에어리즘'를 소개하는 대형 사진도 붙었지만 지갑을 여는 한국인을 보기 어려웠다.
또래 친구 2명과 매장 안을 거닐던 윤모군(17·인천 부평구)은 "한번 구경 삼아 이곳에 왔지만 제품을 사고 싶지는 않다"며 "불매운동 끝나기 전까지 유니클로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창립자인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경영 서적 '성공은 하루 만에 잊어라'를 쓴 바 있다. 국내에도 번역돼 출간된 이 책 제목처럼 유니클로는 그동안 한국에서 이룬 성공을 하루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매장 직원들은 "불매운동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