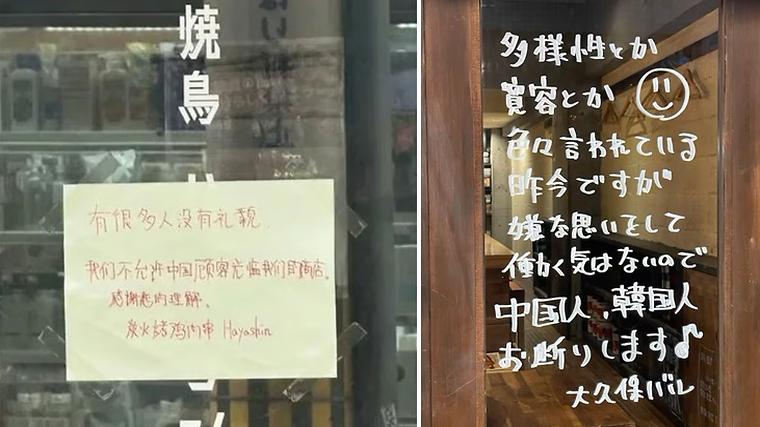지난해 실종신고 0.5%은 장기실종
장기실종 수사팀 전문성 강화해야
장기실종 수사팀 전문성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1. 이병숙씨는 27년 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친구 만나고 올게." 대문을 나서던 동생 뒷모습에 밤잠 설치기 일쑤다. 1992년 당시 경찰은 이병순씨(64, 당시 37세)의 지적장애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성인이란 이유로 실종이 아닌 가출로 판단했다. 14년이 흘러서야 재신고 끝에 실종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랜 세월에 심신이 약해졌다는 이씨는 동생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게 소원이다.
#2. 박정문씨는 지난 1997년 생후 3개월된 아들 박진영군(21, 당시 1세)을 잃고 서울역 노숙을 전전했다. 아이를 찾으러 전국을 누비다 직장도 관두고 재산도 다 털어버린 탓이다. 가족이 직접 발품 파는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정된 직업을 못 가진 지 어언 20년이 지났다.
최근 영화 '나를 찾아줘' 개봉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 실종자 가족(이하 실종가족)은 여전히 애타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역량 미달, 예산 부족 등 오롯이 실종가족이 수색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찰 전문성 부족…가족에 부담 전가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4만2922건으로, 이 가운데 0.5%인 184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은 신고 후 48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실종신고는 장기실종으로 분류된다. 이후 경찰서에서 각 지방 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으로 이관된다.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실종 수사기관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1년에 두 번 실종자에 대한 일제수색을 진행한다. 전국 각지 보호시설을 실종가족과 함께 찾아가 무연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내 보호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 실종자 정보와 비교하는 것이다.
실종가족들에 따르면 현장에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시설 내 기록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 라운딩을 제한하기도 한다. 동행한 경찰은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실무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종자를 찾는 일은 결국 가족의 문제로 남겨진다. 이는 실종가족을 더욱 더 큰 고통으로 내몬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경찰에 실망한 실종가족은 직장도 내던지고 제보에만 의존하게 된다”며 “국가 도움 없이 실종자를 찾다보니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정 해체까지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실종 전문 인력 육성에…부처 간 협력 강화해야
실종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공조가 더 긴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대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포털인 안전드림(Dream) 시스템을 통해 실종가족이 실종자를 모바일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시스템만 있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실종가족이 전국 곳곳을 발로 뛰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 등과 경찰청 간 위상 문제로 협업을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자신의 조직보다 실종자를 찾는다는 동일한 업무 목적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실종수사전담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장기실종사건의 해결책 중 하나로 꼽혔다.
서 대표는 “실종 수사에는 장기간 근무로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실종전담팀이 승진에 유리한 부서가 아니다보니 해당 팀 경찰관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종전담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종전담팀에 남을 경우 인사 상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255개 경찰서에 실종전담인력은 766명이다. 이들의 근속연수는 2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도 “실종전담팀에 경찰관이 오래 머무르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실종전담팀에 한해서는 경찰 조직 내 부서 순환에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eonsu@fnnews.com 강현수 김서원 이용안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