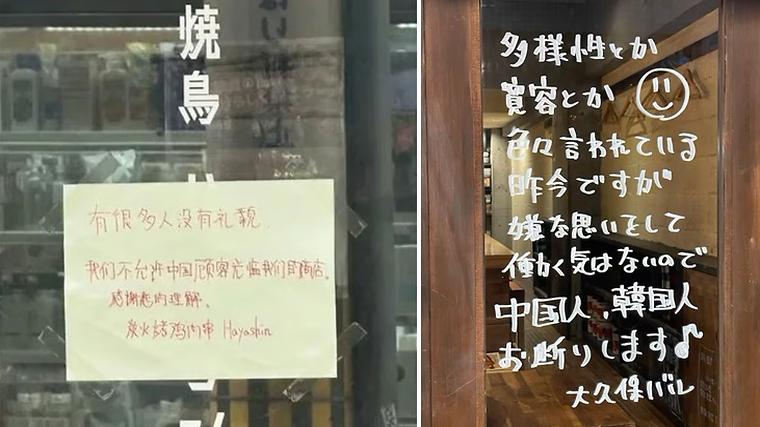(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차량 침수피해가 늘고 있다.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3000건을 넘어섰다. 보험사가 인수한 전손 차량이나 침수 이력을 속인 중고차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중고차 구매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집중 호우로 접수된 차량 피해건수는 3000여건이다. 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접수건수가 10배가량 늘었다.
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가 손상을 입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한다.
문제는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차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손처리된 침수차가 브로커를 거쳐 중고차로 둔갑하는 경우다.
전손처리란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보험사가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비용(보험가입 차량가격)을 보전 받고 보험사는 차량을 인수해간다. 침수피해가 큰 차량은 분해 가능한 부품을 모두 떼어낸 뒤 이를 교체 및 수리해야해 상당수가 전손처리된다.
보험사는 인수한 차량을 폐차업체에 처분하는데 이런 매물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브로커가 있다. 이들은 차량을 싼값에 사들인 뒤 중고부품을 사용해 저렴하게 수리한다. 이렇게 수리된 침수차는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흔적만 감춘 뒤 중고차로 파는 경우도 있다. 이들 중고차는 주로 직거래를 통해 판매된다. 보험처리로 자동차를 수리한 뒤 명의나 번호판을 수차례 변경해 침수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도 있다.
침수차를 구분하는 몇 가지 팁이 있지만 외관수리에 공을 들이는 만큼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오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트렁크 바닥을 드러내 모래 등을 체크하는 방식은 부품 교체 및 세척이 이뤄지면 침수 구분이 불가능하다.
트렁크 웨더 스트립(고무패킹)을 벗긴 뒤 내장재 안쪽의 차체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다. 좌석은 아래 플라스틱 내장재를 들어 올린 뒤 차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프레임 부분은 청소가 까다로워 물때 흔적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운전석 왼쪽 아래 퓨즈박스를 뜯어서 전선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 부분도 마음먹고 분해·청소하면 침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완전한 구분은 어렵다.
구매 전 차량 RPM을 3000 수준에서 5분 이상 가동해보는 것도 침수차를 구별하는 요령이다. 이때 차가 심하게 떨리면 침수에 따른 엔진 이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침수피해가 아니더라도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여서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 게 낫다.
무엇보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우 기간 이전등록 된 차량이나 직후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구매를 피하는 게 좋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까지 보통 한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8·9월 정도에 나오는 물량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간에 꼭 구매해야 한다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에 침수피해 보상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