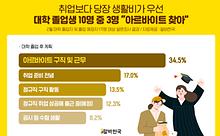(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체계 개편안이 결국 무산됐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추진한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존재감 없는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정책을 수정, 재추진하더라도 의료계와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공백 사태는 봉합됐지만 이래저래 당정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다는 평가다.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7월23일 발표한 당정안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에는 기존 당정안에 대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젊은의사가 요구해온 '원점 재논의 명문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안을 중심으로'란 문구가 전제됐지만, 의료계 요구가 관철됐다는 평가다.
당정의 의료체계 개편안 발표 이후 그간 의료계는 설익은 정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원안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의사들을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도 적극 나섰다.
이같은 정부 강경기조는 오히려 의료계 반발 역풍을 불러왔다. 초기 투쟁은 전공의·전임의가 주도했지만 정부 강경책을 고수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교수, 전공의, 봉직의, 학생까지 의료계 전반이 들고 일어났다.
특히 정부의 정책 추진시점이 미묘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여당은 K-방역 성과로 지지율이 오랐고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정책이었지만 코로나19 완전종식 전 섣부르게 꺼내들어 밀어붙였다. 의료계와 야당에서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정 갈등이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도 다급해졌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파업 전공의를 고발하며 강경대응을 주도해온 정세균 총리는 "의료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의 대응은 가장 비판받는 대목이다.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당정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존재감을 감추고 뒤로 숨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파업사태로 의료계 신뢰도 잃어 향후 정책을 재추진하더라도 의사단체가 주무부처 대신 당정과 직접 협의하는 '복지부 패싱'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정점은 장관인 '박능후 무능론'이다.
의료체계 개편안 동력이 크게 저하된데는 여당 지도부 교체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친문계 대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비문계 이낙연 의원으로 교체되고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여당 기류가 바뀐 점도 원점 재논의 후퇴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당정이 의료체계 개편안 원점 재논의를 약속함에 따라 향후 협상도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면한 감염병 비상시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논의 자체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 의료체계 개편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