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김재경 교수, 미 플로리다주립대 이주곤 교수와 공동연구
비만·치매·노화로 생체리듬 불안정… 새 수면질환 치료법 개발 기대
비만·치매·노화로 생체리듬 불안정… 새 수면질환 치료법 개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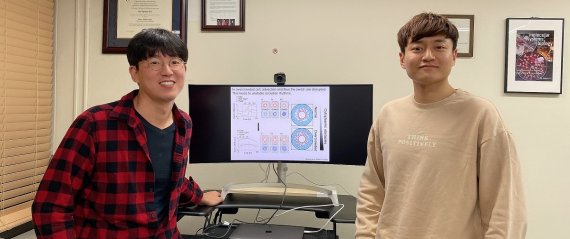
[파이낸셜뉴스] 국내 연구진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비만이 불안정한 수면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가 수면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 연구팀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세포속 분자 이동을 방해하는 세포질 혼잡이 생활리듬과 수면 사이클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이주곤 교수 연구팀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김재경 교수는 "비만·치매·노화가 세포질 혼잡을 일으킴으로써 수면 사이클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방 액포와 같은 물질들이 세포내에 과도하게 많아지면 세포질이 혼잡해진다.
연구진은 세포 내 분자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시공간적 확률론적 모형을 자체 개발했다. 또 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PER 단백질이 세포핵 주변에서 충분히 응축돼야만 핵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재경 교수는 "인산화 동기화 스위치 덕분에 수천 개의 PER 단백질이 일정한 시간에 함께 핵 안으로 들어가 안정적 생체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체시계는 인간이 24시간 주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과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생체시계는 밤 9시경이 되면 우리 뇌 속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해 일정 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동 능력이나 학습 능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리 작용에 관여한다.
2017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영, 제프리 홀 그리고 마이클 로스바쉬 교수는 PER 단백질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 PER 유전자의 전사를 일정 시간에 스스로 억제하는 음성피드백 루프를 통해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생체시계의 핵심 원리임을 밝혔다.
하지만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는 복잡한 세포 내 환경에서 어떻게 수천 개의 PER 단백질이 핵 안으로 일정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생체시계 분야의 난제로 남아있었다. 이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수천명의 직원이 혼잡한 도로를 통과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도 같은 문제다.
김재경 교수는 "이번 연구가 세포질 혼잡 해소가 수면 질환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면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KAIST 수리과학과 김대욱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해 국제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0월 26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