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의 Yo!Run!Check! 15] 박성민, <술에 취한 세계사>
[파이낸셜뉴스] 2021년 기준, 전국 서점은 2000곳 정도다. 그중 551곳이 독립서점이다.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습지나 종교서적 대신 주인 취향을 반영한 단행본 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으로, 최근 수년 간 급속히 늘어났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채 100곳이 되지 않던 독립서점이 5배 넘게 몸집을 불린 것이다.
독립서점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의 취향이 한껏 묻어난 분위기다. 지점마다 큰 차이가 없는 대형서점과 달리 독립서점은 주인의 취향에 따라 판매되는 책부터 책이 진열되는 위치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책과 문화를 아끼는 이들이 주요 고객으로, 동네 문화인의 사랑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하다. 기술발달에 따라 전자책 이용자가 늘어나고 온라인 서점도 활성화된 상황에서 독립서점이 지닌 한계는 갈수록 선명해진다.
독립서점도 결국은 자영업이다.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가 생존과 직결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렇듯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프루스트의 서재, 일 년의 기록
여기 한 명의 독립서점 주인이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프루스트의 서재’라는 이름을 단 책방을 열고 매일 일기를 쓴 박성민씨가 그 주인공이다. 일 년 동안 꼬박 쓴 서점 주인의 일기장은 <되찾은 시간>이란 이름을 달고 정식 출간됐다.
일기장은 서점이 처음 문을 열고 자리를 잡기까지의 기록이다. 저자는 이 일기를 가리켜 ‘생존을 위한 기록처럼 느껴진다’고도 표현했다. 간판을 달고, 첫 손님을 맞이하고, 책을 팔고, 영업사원에게 작은 사기도 당하고, 독서모임을 여는 모든 순간순간이 생생한 기록으로 남았다. 이 기록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아주 가까운 단골이 되어 서점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감상을 안겨준다. 작지만 귀한 감동이다.
‘대림아파트 사는 그분은 서점 앞을 머뭇거리다가 들어왔다. 약간 더듬거리는 말투, 책을 빌려주는 곳이냐고 묻는다. 사고파는 곳이라고 알려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한다. 이런 동네에 책을 사고파는 책방이 있다는 것이 쉽게 상상되지 않았단다. 근처의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파는 시대에 이렇게 책방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면서. 좋아서 한다고 했더니,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듯이 목소리를 키웠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것도 책을 통해 배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차를 한 잔 권해드리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신은 근처 대림아파트에 사는데 책을 좋아해서 동네 도서관도 자주 가고 예전에는 고구마(헌책방 이름)에서 책도 가끔 사서 봤다고, 지금은 없어졌으며 서울에서는 헌책방이 안 된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책을 사고파는 것을 떠나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들은 나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안부를 묻는 것 같다. 그동안 잘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다시 볼 수 있는지. 대림아파트 그분은 차도 한 잔 얻어 마셨으니 다음에 들러 책을 사겠다고 말하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2015년 1월 21일의 일기.

주변을 물들이는 용기의 지도
책방 주인은 하루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짤막하게 기록한다. 때로는 기쁘고 뿌듯하지만 또 때로는 슬프고 허망한 나날들.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실망스럽지만 다시 일어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책방 주인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려진다.
책을 읽으며 느껴지는 감상은 선명하다. 책방은 결국 사람을 향해 나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책방에 모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이 몇 권쯤 골라 들고 나가는 덕분에 일상이 유지된다. 책 뒷표지에 적힌 ‘책은 사람을 이어준다’는 말은 책방 주인이 일 년을 겪은 뒤 얻은 깨달음인 것만 같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어렵다는 첫 1년을 버텨낸 프루스트의 서재는 벌써 8년차 서점이 됐다. 그 사이 단골들도 많이 생겼고 여기저기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지역 명소가 됐고 독서와 낭독 모임도 활발하다.
주인장은 프루스트의 서재를 연 이유에 대해 ‘동네에서 책방을, 인문학 서점을, 중고책을 다루는 것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좋기 때문이다. 그냥 좋다. 나에게 맞다’고 적었다. 사실 대단한 일이다. 그저 좋아서 어느 일을 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용기의 지도' 같은 책이다. 좋아하는 것을 향해 용기를 낸 어느 서점 주인이 겪은 1년의 기록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미덕과 마찬가지로 용기 역시 주변을 물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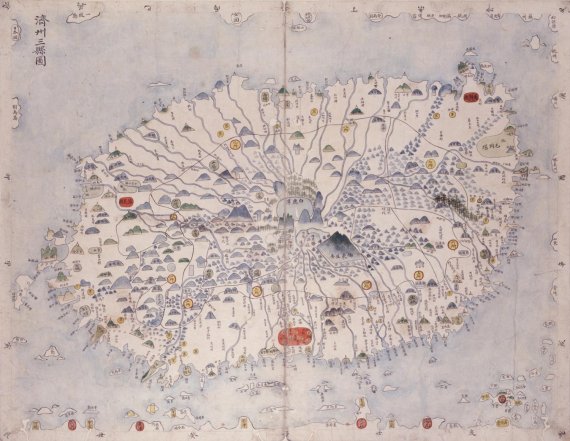
■김성호 기자의 브런치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성호의 요런책'을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