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삶은 내가 있어야 할 곳, 있어도 되는 곳을 찾는 과정
치열한 갈등 맺고 풀면서 각자 자리로 다가갈 수 있어
치열한 갈등 맺고 풀면서 각자 자리로 다가갈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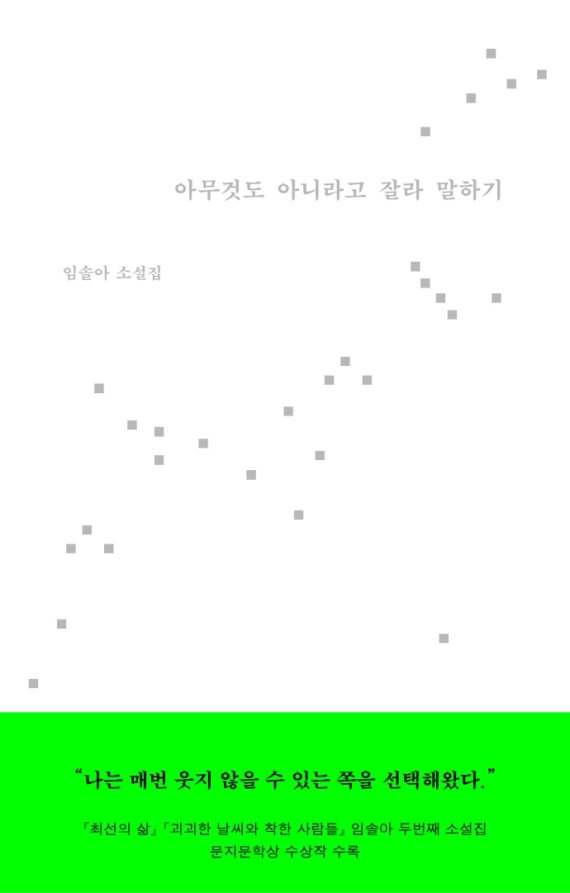

셀 수 없는 관계들에 엮인 우리, 배역에 맞는 얼굴을 하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내는 우리, 기대에 부응하려 하는 한편 어긋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우리, 그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부단히 애를 쓰는 우리. 임솔아의 소설집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와 김초엽의 소설 '므레모사',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런 우리를 그린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는 '최선의 삶',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눈과 사람과 눈사람' 등 소설과 시를 꾸준히 발표해온 임솔아 작가의 두번째 소설집이다. 소설의 인물들은 부모와 자식으로, 단짝으로, 일종의 동지로 존재하며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일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완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포기하기도 달아나기도 한다. 그런 그들은 각 단편 안에서, 또 소설과 소설 사이에서 느슨하게 서로 연결된 듯 보이는데, 그 연결의 선은 일순 선명해지는 것 같다가도 곧 흐려지고, 잊히는가 싶으면 어느새 슬그머니 형태를 드러낸다.
모두 서로가 주인공인 극에 잠시 올랐다 다시 내려가는 현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야기 전체를 꿰어내는 그 희미하고 가느다란 연결의 선이 마침내 여기로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므레모사'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지구 끝의 온실', '방금 떠나온 세계' 등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온 김초엽 작가의 첫 SF 호러다. 과거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던 땅 '므레모사', 다시 그곳에 터전을 잡은 이들에 의해 므레모사는 귀환자들의 마을이 되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허가된 후 여섯 명의 여행자가 그곳의 첫번째 방문객이 되고, 그 가운데 환지증에 시달리는 무용수 유안이 있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유안은 무대에 오르며 공연을 망치는 상상을 한다. 그가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아름다운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이들 앞에서 결코 털어놓지 못할 진짜 마음을 숨긴 채로. 유안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어떤 순간을 끊임없이 그리면서도 아주 오래 그것을 놓지 못한다.
이렇게 역할을 주고 받으면서 갈등을 맺고 풀면서 견고해진 이야기들, 그 한 겹 아래에는 어쩌면 자리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역할이 자리를 만들고 역할이 흔들리면 자리도 위태롭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있어도 좋은 곳을 찾는 것은 모두가 매일 치열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과제일 터다. 우리는 때로 무대를 지키는 데 전력한다. 무성의 존재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비구니는 자신에게도 절에도 이상적인 여성성을 덧입혀 유명 사찰의 주지가 되고(임솔아 '단영'), 자살이 빈번해진 학교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학교의 제안을 받고 자살한 이의 친구인 척 애도의 글을 써 낭독한다(임솔아 '손을 내밀었다'). 한편 우리는 무대를 벗어나 새로운 자리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오랜 기간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온 누군가에게는 '오십대 무경력 주부'가 아니라 오롯이 그 자신으로 있기 위해 무결한 초파리 실험동이 필요하고(임솔아 '초파리 돌보기'), 자기 자신으로 있을 곳을 잃은 누군가는 죽음의 땅 위에 세워졌다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다(김초엽 '므레모사').
다종다양한 관계들로 이뤄진 사회에서 '나'는 '누군가의 무엇'이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들지도 모른다. 안전하게 돌아갈 곳을 마련해 두지 않고는 한걸음 떼기도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꿈꾸게 되는 것은 최소한 각자의 본질을 해치지는 않는 것, 온전한 자신이 되는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소망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한걸음 더 가보는 것, 필요하다면 기꺼이 무대를 박차고 내려오는 것. 작품 속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좌절하고 실망하다가, 다시 일어서서, 이제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박형욱 예스24 MD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