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쓰기는 예술이 아닙니다."
2018년 봄쯤, 대학에서 소설을 가르치고 현직 소설가이기도 한 강사님은 첫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쓰기는 '예술'보다 '기술'에 가깝다. 누구나 노력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남긴 히포크라테스 역시 'Art'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술'이 아닌 '기술'이라는 의미로 썼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수많은 의학 '기술'을 익히기엔 한 인간의 삶이 짧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영어를 못한다고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글쓰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 글을 잘 쓰지 못한다고 해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스티븐 킹 역시 습작 시절 수많은 글을 여러 곳에 보냈지만 언제나 퇴짜를 맞았다. 스티븐 킹은 책상에 못을 하나 박아 놓고 퇴짜 맞은 글을 적은 종이를 쌓아 갔다. 어느새 퇴짜 맞은 글이 못의 길이를 가득 채웠을 때, 스티븐 킹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그 못을 뽑고 더 긴 못을 그의 책상에 박았다. 스티븐 킹은 무라카미 하루키 만큼 유명한 작가이자 '글쓰는 법'의 바이블 격인 '유혹하는 글쓰기'의 저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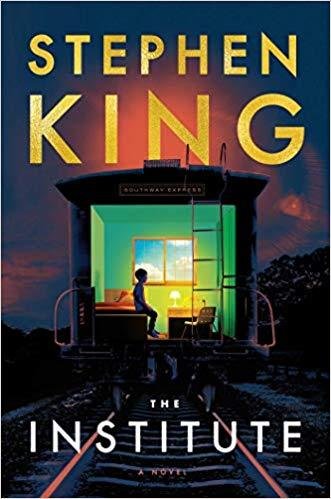
강사님은 글쓰기는 크게 논리적 글쓰기와 서사적 글쓰기가 있는데 논리적 글쓰기는 누구나 훈련을 통해 잘 쓸수 있다고 말했다. 서사적 글쓰기는 노력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소설 꿈나무들의 첫 수업에서 굳이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서사적 글쓰기 혹은 문학적 글쓰기를 "뒤늦게 도착한 편지"라고 정의했다. 뒤늦게 도착한 편지는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뒤늦어야 한다.(음미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도착해야 한다(한없이 늦어지면 안 된다.) 셋째, 내용이 있어야 한다.(말장난과 농담도 뒤늦게 도착은 하지만 의미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총 3가지 정의가 나온다.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번째 정의에 따르자면 아름다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글쓰기는 '예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프랑스에서는 헤겔의 미학 연구에서 쓰였던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문학 등 5개를 기본 예술로 봤다. 이후 근대에 무용·연극 등 공연예술, 영화, 사진 등도 예술의 장르로 보고 있다고 한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알면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무언가를 속속들이 알게되면 결국 사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행동하게 된다"고도 했다.

어쩌면 내가, 혹은 우리가 주말에 미술관에, 극장에, 콘서트홀에 잘 가지 않는 것은 예술을 잘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덕수궁 돌담길을 내 오른편에 두고 걸어 올라가다 보면 갈림길 끝에서 검은색의 사람 6명을 위에서 꾸욱 눌러준 모양의 동상이 나온다. 언제나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동상에만 시선을 두고 걸었다. 하지만 그 동상에서 왼편 언덕을 올라가니 숨겨져 있던 공간이 나타났다. 서울시립미술관이었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과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알찬 공간이었지만 문화부 기자를 하기 전까지 그런 곳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 현재는 장 미셸 오토니엘의 '정원과 정원'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는 '유리구슬 조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현대미술가다. 수많은 유리구슬을 쌓아 올린 듯한 은빛 구체를 응시하면 구슬 속에서 조금 다른 각도와 크기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개의 눈을 마주하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쯤에서 '뒤늦게 도착한 편지'처럼 필자도 멋지게 '예술'을 정의해 보자. 무언가를 알아가는 한 가지 방식은 그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테다. 필자에게 예술은 "암호로 적힌 다잉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예술을 이해하고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술가들이란 'A'라는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A'를 'A'가 아닌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 'A'를 'B'나 'C'로 표현하기도 하고 'ㄴ'이나 '木' 등 전혀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술가가 남긴 작품의 진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암호에 대한 해독이 필요하다. 그 암호는 외국어 일수도 있고, 어떤 규칙과 배경 속에서만 이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관람자(독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술가들조차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A'를 닮은 어떤 것이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붓에 물감을 적셔 선풍기를 틀고 캔버스에 붓을 휘두르는 화가는 자신의 작품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모를 것이다. 다만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A'에 다가갈 때까지 그 작업을 여러 번 정밀하게 반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예술가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에게 꼭 그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기는 다잉메시지처럼 그 메시지가 누군가에는 제대로 닿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환주의 아트살롱'은 회화, 조각, 음악,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영역의 전시, 시사회 등의 후기와 리뷰, 각종 문화 관련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