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이여 나의 친구여 !>
너도 시인이야
너도 시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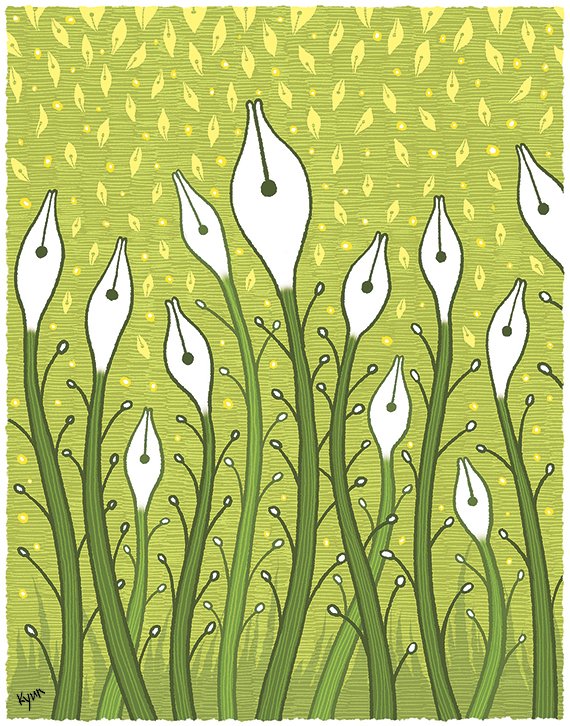
봄이 왔다. 눈엽(嫩葉)이라고 했다. 이 눈엽이 신록이 되고, 그 신록이 녹음이 되고, 그다음은 낙엽이 된다.
계절은 약속의 신이다. 그 겨울의 영하를 녹이고 우리 집엔 모란이 꽃잎을 열고, 그 겨울의 20도를 녹이고 기어이 고광나무의 하얀 꽃을 피우게 했다. 꽃은 차례대로 피우지 않았다. 땅 위로 가지 위로 새순을 밀어올리는가 싶더니 산수유, 영춘화, 생강나무, 목련, 매화도 지고 개나리도 아득히 지고 철쭉과 명자나무가 뜰을 밝히고 있다. 벚꽃이 철 이르게 활짝 피우다가 또한 멀어져 갔다. 4월 꽃이 아니라 3월 꽃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봄꽃들의 아름다움은 무리 지어 피는 데 있다. 조금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도 무리 진 꽃들 앞에 서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꽃이 지면 잎이 온다. 자연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인간과 인간이 왜 실수를 하지 않겠니. 가족은, 친구는, 동료는, 이웃은 '이해'라는 거대한 감정으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3월에 동네 벚꽃을 친구들과 보다가 한 친구가 말했다. 그것도 시큰둥하게 자기를 비하하며 말한다. "넌 좋겠다. 시인이라서 늙어도 시인은 살아 있잖아. 난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
꽃을 보다가 그 친구는 자신을 되돌아 보았을까. 나는 꽃 앞에서 실례라고 꽃 앞에서 나이 불문 꽃이 되어 보라고 웃으며 말했다. 공직자의 아내로 3남매를 길러 결혼 잘 시키고, 손주 봐주고, 손주 결혼시킨 그 업적을 바닥으로 내모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분은 알겠다. 우리 나이에 돌이켜 보면 뭘 했는지 희미하고, 시집을 낸다는 친구가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자신의 지난날에 왕관을 씌우진 못해도 자기 비하는 금물이다. 꽃을 보고 놀라고, 향기를 맡고 꽃 앞에서 자신을 불러내어 자기 모습을 보았다면 너도 시인이야.
아, 80의 강을 건너 왔네. 비오는 날 커피를 마시며 창으로 보이는 풍경을 전화로 낮게 이야기해주던 너는 시인이야. 이 세상에 엄마만 한 시인이 어디 있겠니. 사랑, 희생, 기도 이것을 완벽하게 실천한 엄마는 아무래도 시인이라고, 예술가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다만 문자로 남기거나 등단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뿐이다. 침묵의 예술가라고나 할까.
가족으로 살아 보았다면 너는 시인이야. 가족은 사랑으로 존재하지만 가끔은 그 사랑에 금이 그이기도 하는 거지. 사랑도 때로는 헛딛고 지칠 때가 있는 거야. 표현할 수 없는 금이야 아프고 절망감도 있지만 그런 빗금이 수만개 온몸에 그려지지만 사랑이라는 지우개로 천천히 지우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아픔을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아주 작은 가족의 기쁨으로 수만개의 빗금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면 너도 시인이야. 가족이란 사랑 더하기 미움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백번 그렇지. 인간이니까. 인간과 인간이 왜 실수를 하지 않겠니. 그래서 가족은, 친구는, 동료는, 이웃은 '이해'라는 거대한 감정으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깨닫는다. 지루함을 벗어야 하지. 세상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아름다움과 음악을 찾는 너는 분명 시인이라고.
가족으로 살아 보았다면 너도 시인이야. 어느 순간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는 그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잘 보이지 않아 사랑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외롭다가도 어느 한순간 어느 가족이 "엄마!" 하고, "여보!" 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간절히 부르면 아무것도 없고 사랑만 보이는 이상 경험을 했다면 너는 시인이야.
가족 누구도 모르게 홀로 어떤 문제를 안고 괴로워한다면 실제로 가슴이 아프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프다가 세상은 참 외로운 것이구나 생각했다면 너도 시인이야. 그래 맞아. 가족이 아니라 인생이, 삶이 외로운 것이지. 왜냐하면 인생이, 삶이 너무 거대하고 살아갈수록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해서. 사실 그래서 가족은 가장 필요한 것인지 몰라.
수수께끼투성이이지만 조금은 자기를 낮추고 배우는 심정으로 인생에 다가가면, 그러다가 느끼는 수만가지의 감정이 있다면. "이 감정은 뭐지?"라고 생각했다면 너도 시인이야.
홀로 울어 보았다면 너도 시인이야. 그리고 툴툴 털고 운 흔적을 지우며 방긋 웃으며 가족을 대한다면 너도 시인이야. 인생은 대광야라고 한다. 나는 인생을 용서하는 사람이야. 그래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이 정도면 탁월한 거지, 참을 만한 거지. 그렇게 덤을 준단다
인간에겐 인간이 해명할 수 없는 함정이 있어. 마음과 몸과 생각이 다르게 돌아가는, 그래서 스스로도 놀라는 행동에 갇히는 경우도 있지. 슬프기도 해. 쓸쓸하거든. 굶주린 느낌도 들거든. 이런 것을 정서적 허기라고 부르지. 아마도 우리 나이면 다 경험의 이름으로 통과된 지난 길이었을 것이고 우리 앞에 남아있기도 해.
정서적 허기는 약이 없어. 약이 있다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사물과 친해지는 거야.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긍정의 사고로 오늘 이 하루의 이 시간을 바라보는 거지. 고개를 끄덕이는 너는 그래서 시인이야.
나는 깨닫는다. 지루함을 벗어야 하지. 세상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하늘이 가진 것, 땅이 가진 것, 허공이 가진 것, 계절이 가진 것 그리고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귀한 책들…. 너는 아침 라디오 음악을 듣다가 내게 전화한 적이 있지. 나는 생각했다. 지루함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움과 음악을 찾는 너는 분명 시인이라고 말이다. 모두 말 잘하는 것을 배우는데 너는 언제나 침묵도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래! 너야말로 시인이야. 그럼! 너는 대시인이야.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