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멤버 현 4명에서 4명 확대 8명 구성 유력
샘 올트먼, MS 인사 2명 합류설 확산돼
비영리라는 오픈AI 정체성 사라지나
샘 올트먼, MS 인사 2명 합류설 확산돼
비영리라는 오픈AI 정체성 사라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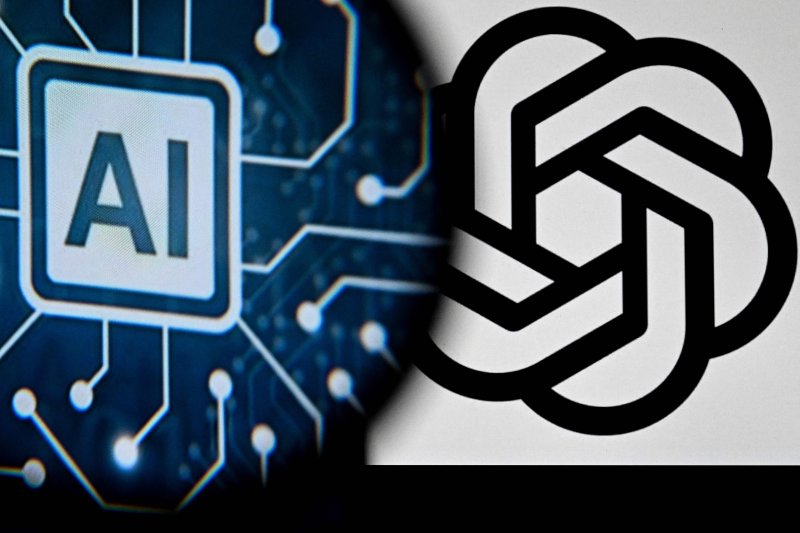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샘 올트먼 오픈AI CEO 해고부터 복귀까지 혼돈의 1주일을 보낸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오픈AI는 이사회 멤버를 확장하고 거버넌스(지배구조) 변화라는 숙제를 푸는 중인데 올트먼 CEO와 오픈AI의 지분 49%를 보유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 멤버가 이사회에 합류할 지 주목된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올트먼과 MS 멤버가 새 이사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샘 올트먼, MS 임원 2명 이사회에 합류?
23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픈AI는 현재의 4명인 이사회 멤버를 총 8명으로 4명을 늘리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픈AI 이사회의 남은 5개의 이사회 자리를 올트먼과 MS 임원이 각각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소문대로라면 올트먼과 MS 임원이 총 3자리의 오픈AI 이사회 멤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올트먼을 해고했던 오픈AI의 이사회 멤버 4명 중 3명이 회사를 떠나면서 오픈AI는 이사회 멤버는 단 1명만 남은 상황에서 오픈AI는 새로운 이사회 멤버를 일부 수혈했다. 새 이사회 멤버로 세일즈포스의 전 공동 CEO인 브렛 테일러와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인 래리 서머스가 합류한 것이다. 올트먼을 해고시켰던 이전 이사회에서 멤버 가운데는 유일하게 애덤 드앤젤로가 남아있다.
오픈AI CEO로 복귀했지만 올트먼은 새롭게 재구성된 이사회 멤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트먼은 CEO 복귀 당시 자신을 이사회 멤버로 포함시키지 않는 합의에 서명하며 현재 영향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WSJ은 "올트먼이 다시 이사회에 합류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MS가 오픈AI의 새로운 이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져갈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은 MS가 오픈AI의 새로운 이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것에 무게가 실려있다.
MS가 새로운 오픈AI 이사회에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면 MS는 MS에게 부족했던 오픈AI 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적어도 CEO가 해임되는 당일에 해당 소식을 몇 분전에 인지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MS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오픈AI의 이사회 변화에 고무적"이라고 적었다.
새로운 이사회의 오픈AI 어디로 가나
새롭게 임명된 이사회에 대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오픈AI가 왜 이사회에 팀닛 게브루나 마가렛 미첼과 같은 유명한 AI 윤리학자를 영입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벤틀리 대학의 수학과 교수이자 SNS 추천 알고리즘에 관한 책을 저술한 노아 지안시라쿠사는 오픈AI 이사회 새로운 멤버가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서머스가 합류한 것을 비난했다. 기안시라쿠사는 테크크런치에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에 그런 인사가 합류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샌포드의 AI 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토퍼 매닝은 "새로 구성된 오픈AI 이사회는 아직 불완전하다"라면서 "책임감 있는 AI의 사용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고 백인 남성으로만 구성된 현재의 이사회 구성은 좋은 시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올트먼을 교체하려고 했던 기존 이사회는 드안젤로를 통해 수익보다 AI 안전에 중점을 둔 오픈AI의 비전을 옹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이사회 멤버들은 AI 개발을 지지하는 견해로 올트먼의 경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사회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사회 멤버들은 오픈AI 지배구조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WSJ도 오픈AI의 이사회가 개편되더라도 오픈AI의 특이한 기업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사회가 안정된 후에는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전 이사회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안전한 AI 개발에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라는 오픈AI의 오랜 정체성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