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노량’ : 고독한 한 사내의 삶과 죽음, 역사를 호령하는 북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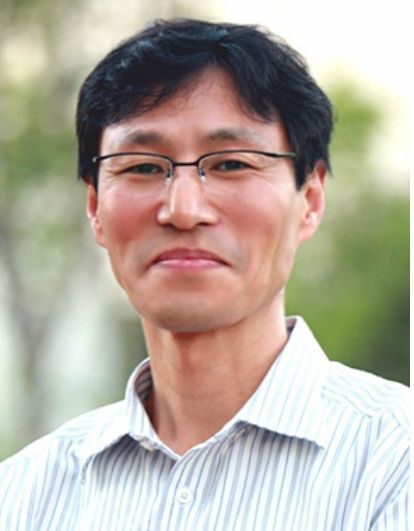
거센 파도속에서 무리에 둘러싸인 한 남자가 있다. 영화 ‘노량’ 주인공 이순신(배우 김윤석)이다. 영화 초반부에는 순천 왜성을 바라보았고, 노량대첩에 임박해서는 몰려오는 적선을 바라본다. 영화 속 이순신의 눈빛은 총기를 잃은 듯 빛나지 않았다. 7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만든 원수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에 찬 이글거림도 없었다. 공허! 공허! 공허! 그 자체였다. 말수도 적고, 그나마 몇 마디 말조차도 차가운 겨울 바다 냄새가 난다. 침몰하는 배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절명하기 직전에 그가 남긴 그 유명한 유언, “지금 싸움이 급하구나.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같은 말을 할 때도 그저 오랜 책임감의 무게에 눌린 듯한 모습이다.
‘노량’에는 서로에 대한 죽임이 가득하다. 그 어느 곳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죽임의 바다와 죽음의 바다를 향할 뿐이다. 죽임이 만든 죽음도 배 안에 쓰러져 있거나, 바닷물에 넘실거린다. 영화의 부제가 ‘죽음의 바다’인 이유가 그것 때문인 듯하다. 이순신은 왜 그 죽음의 바다로 향했을까?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이순신을 가로막으며 한사코 그 바다를 거부했어도, 다 끝난 전쟁임에도 끝끝내 그 바다로 갔을까?
영화를 보다 보면, 꿈에 혹은 전투 현장에서 죽은 아들 면이, 또 옛 동료로 이미 죽었던 광양 현감 어영담, 전라우수사 이억기가 귀신으로 혹은 환영으로 등장한다. 전투 직전에는 7년 전쟁 동안 전사한 조선 수군 전사자 명부가 이순신에게 전달되고 그 명부 속 이름을 살펴보기도 한다. 이순신이 그 바다로 가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들인 듯하다. 복수다! 침략자들에 대한 복수다! 완전히 섬멸해 다시는 이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의 상징이다.
그런데도 영화 속 대부분의 이순신 모습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허하다. 뭔가에 홀린 듯하고 가슴 한켠이 무너진 듯한 모습이다. 간절함은 그의 표정과 눈빛, 말, 몸짓 그 어디에도 묻어나지 않는다. 자신을 억누르는 모습도 없다. 전투 막바지에, 영화의 끝무렵에 그가 온 힘을 다해 북을 칠 때조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가 울려대는 북소리에 그의 표정과 말, 몸짓에 보여지지 않았던 속마음이 대신 전해지는 듯하다. 1594년 3월 10일, 경상도 웅천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할 때 일본군 공격을 중지하라는 명나라 관리에게 이순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아있는 흉악한 무리의 배 한 척, 노 한 개도 돌려보내지 않게 해 나라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씻고자 합니다.” (「담종인 도사의 ‘왜적을 무찌르는 것을 금지하는 패문’에 대한 답장」
쿵쿵 울리며 바다를 진동시키는 북소리는 “단 한 척, 노 한 개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그의 호령이며, 복수를 위한 절규이다. 영화를 2시간을 넘게 지배해온 지루함과 차가움, 중국어와 일본어, 포성 소리와 칼이 부딪치는 소리 모두를 제압한다. 새삼스럽게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준다. 또 이순신의 죽음과 함께 수평선에서 떠오른 태양은 고독한 남자 이순신이 원치 않았던 죽임과 죽음의 바다의 세월이 끝났음을,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왔음을, 희망의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영화 ‘노량’을 위대한 영웅, 멋진 해전 장면 같은 관점이 아니라 험난한 시대에 지독할 만큼 고통스럽게, 또 처절하게 살다 간 불쌍한 한 사내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내는 현대를 살아가는 뭇 초로의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과 같다. 또 어느 순간 늙어버린 남편의 모습이며, 사회에서 은퇴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
다만 이 영화는 관련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혹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투 장면으로 때때로 지루할 수 있다. 또 영화가 시작되기 전의 광고 시간을 포함하면 거의 3시간이 될 정도이다. 평범한 영화관 좌석이라면 옴짝달싹 못해 몸도 불편하게 된다.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물을 적게 마시고 가는 것이 좋다. 잘 때 코를 고는 분이시라면 수면 역시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다. 자칫 졸거나 깜빡 잠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