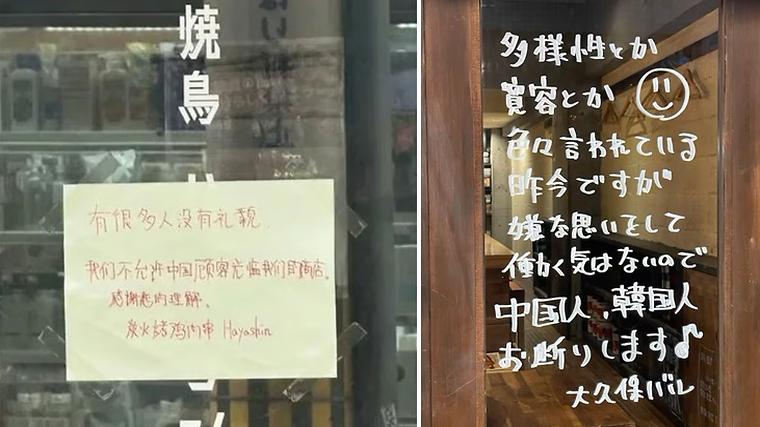재논의 시사 담화에도 의사들 냉랭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도의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도의

지난 1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의료계는 당장 증원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았어도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로 2000명 증원안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정확한 언급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2000명'은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지금부터라도 대표들이 모여 1000명이든, 1500명이든 윤 대통령의 말대로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된 증원 수치로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담화를 아예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0명 증원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안하무인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 이보다 더한 사정이 있더라도 의사는 환자 곁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의사 자신의 가족이 그 지경에 놓여 있다면 청진기를 놓고 병상을 이탈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증원계획을 무조건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유화 제스처를 보여줬다고 본다. 담화 내용이 두루뭉술하다거나 당초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숫자 조정이나 축소 의사를 피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시점에서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칼자루를 자신들이 쥐었다고 의기양양해할지 모른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들의 공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으니 주도권이 의사들에게로 넘어왔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부를 무릎 꿇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의사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갈등의 장기화로 의정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총선 정국과도 맞물려 지지율을 걱정하는 여당 후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기세가 등등하다. 국민이 의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런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의료개혁의 명분과 근거에 반기를 들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일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걸렸더라도 충분한 사전협상을 통해 미리 절충안을 만들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본다. 선거가 끝난 후에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면 혼란도 덜했을 것이다.
의사들은 일단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그런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선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상대할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