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자 시인의 고통이여 나의 친구여 !
■ 아침이 오는 것은 기적이다 ■
새벽창을 열면 보이는 풍경, 활짝 핀 개나리와 모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안에 감사를 진하게 새기는 것뿐
주변의 사람과,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 때론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파도타는 법을 알면 즐거움이 되듯,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 아침이 오는 것은 기적이다 ■
새벽창을 열면 보이는 풍경, 활짝 핀 개나리와 모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안에 감사를 진하게 새기는 것뿐
주변의 사람과,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 때론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파도타는 법을 알면 즐거움이 되듯,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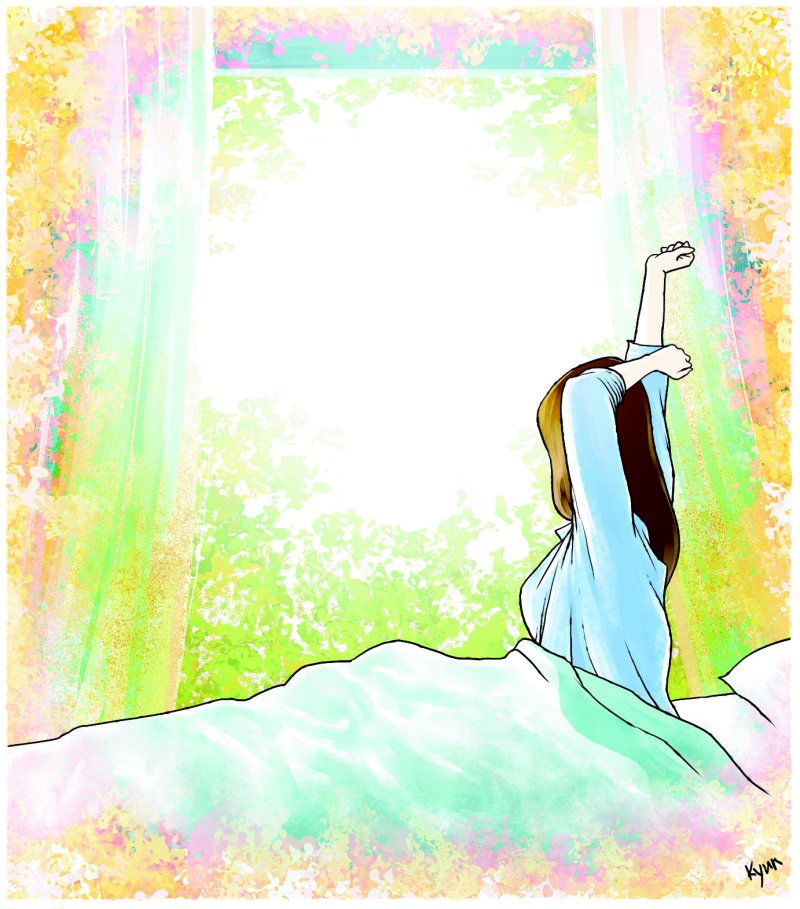
가령 아침이 온다는 것, 저녁이 온다는 것, 태양이 떠오르는 것. 불타는 그림자를 남기고 저녁놀이 질 때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원래 그런 거야, 늘 그래왔잖아. 저녁이면 해가 기우는 거야, 해가 기울 때는 하늘이 붉은 그림자를 남기지. 그건 당근이지 안 그래? 등등. 당근으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봄이라고, 봄이니까 꽃이 피는 거라고 한다. 그렇게 줄지어 꽃들이 피어나는 찬란한 봄을 바라보며 손뼉을 치며 봄이니까라고 하는 것이다. 늦은 밤하늘에 몇 개의 별이 반짝일 때 그것도 당근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당연하다고 보면 감동이 없다. 알락할미새가 꼬리를 흔들며 예쁜 소리로 지저귀는 것도, 산까치가 바로 앞 담장 위에 앉아 그 긴 꼬리로 풀피리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봄이 왔네 봄이 왔어 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그만큼 사라진다.
그렇다. 봄이니까 꽃피고 아침이니까 태양이 뜬다. 그러나 이것은 당근이 아니고 기적이다. 아침을 맞는 일, 그것은 위대한 기적이다. 새벽 창을 열면 보이는 모든 사물들, 자연, 사람들이 모두 기적이다. 언제나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면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며칠 비가 내렸지만 이번 봄은 참으로 현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흥분이었다. 꽃들은 한 잎 한 잎 자신의 아름다움을 깡그리 쏟아내며 향기를 내어주었다. 산수유가 그랬고 벚꽃이, 개나리가, 진달래, 철쭉이 그랬다.
뒤를 이은 모란은 그 옆을 떠나지 못하게 날 붙들었다. 금낭화는 오래도록 웃어주었다. 드디어 작약이 참을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낸다. 그러다가 흰색 세상을 펼치는 꽃들이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이팝나무, 조팝나무, 찔레, 아카시아가 천지를 하얗게 출렁이는 모습은 살아있음을 축복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조금씩 피어나는 불두화도 하얗게 인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절의 봄은 나를 철들게 한다. 나이가 지긋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존재 자체의 희열을, 그 농도를 지긋이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 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나를 만난다. 이런 나이에 반드시 하고 떠나야 할 말들, 말하자면 진정한 '인사'를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를 마음 안에 진하게 새기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의 교감은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이다. 사랑, 그것은 평생 동안 계속 연습해야만 느릿느릿 걸어오는 형상이며 감각일 것이다.
발견하고 기쁨에 넘칠 때 더욱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것일까. 아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몸은 정상을 벗어나고 병원 출입이 잦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물, 나무, 산, 강과 꽃들, 통틀어 자연이라는 이 거대한 존재들은 나를 향한 응원가이다. 그리고 내가 비틀거릴 때 내어미는 이 세상의 따뜻한 '손'들이다. 거역의 손이 아니라 보듬어주는 어머니의 손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다. 조금 외로워도 주변에 나직하게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을 존재들이 많다. 나는 5월이면 이 모든 생명의 연주자들인 나무나 꽃들을 보며 어머니라고 부른다. 어머니가 가신 지 벌써 40년이 되어가지만 가장 어머니가 계실 것 같은 예감을 주는 것은 바로 자연이다.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거기 계실 것이다.
오늘 아침 내가 바라보는 노오란 장미 송이 속에 어머니 얼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자. 신은 오늘 하루에만 8만6400초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 주변 응원가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힘을 받을 일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하나의 파도처럼 위기이지만 파도 타는 법을 알면 즐거움이 된다. 그만큼 특별한 선물이 된다. 그것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세상에는 화가 나는 일이 많다. 소외감을 느낄 때도 많다. "왜 또 나야" 하고 억울한 저항을 할 때도 많았다. "신(神)은 없다. 신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늘에 손가락질을 하며 대드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불행 뒤에는 반드시 행운이 있었다. 불행과 다투느라 행운을 아는 척하지 못했던 것이다. 불행은 하나의 파도였던 것이다. 성심을 다해 그 파도를 넘으면 온도가 적당한 우리의 일상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연 없는 삶은 없다. 1990년도 '물위를 걷는 여자'라는 소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를 한 달 동안 정지시킨 일이 있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라고 서문에 썼던 일이 계기였는데, 그럼 이번엔 내 이야기를 써달라, 내 이야기가 훨씬 더 파도가 크다는 것이었다. 제주에서 전라도·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서울에서 나를 찾아온 여성들이 20명은 되었다. 밤 11시에도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밤에 남의 집 대문 앞에 섰을까 생각하면 그 사연의 무게를 알 것 같다. 사연은 내 것이 가장 커 보인다. 생명이 있으면 사연은 있다는 걸 그때 더 알았다. 아마도 그때 그 사연들도 다 정리가 되고 모두 가늘게 웃고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사연들을 책으로 내고 싶었던 그 시절 여성들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려 했을 것이다. 파도를 넘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신달자 시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