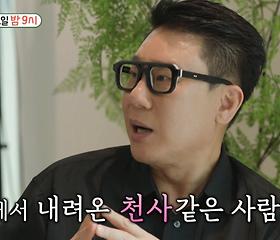일상 스며든 '영상 AI 기술'
'정치적 의도' 딥페이크 영상 다수
아카데미서도 'AI 기술 논란'

[파이낸셜뉴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때리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비상식적인 '밈' 영상이라 누가봐도 가짜임을 짐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언뜻 넘기다보면 실제로 착각할 정도로 자연스럽다. 최근 두 대통령의 충돌이 화제가 되자 누군가가 빠르게 풍자 의도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챗GPT에게 해당 영상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비교적 간단한 AI 도구로 제작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이 보편화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간단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딥페이크 악용 가짜뉴스 '골머리'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등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부가티의 새 모델인 '투르비옹'을 450만 유로(약 67억원)에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됐다. 친 러시아 성향의 인플루언서들이 이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로 퍼날랐다. 영상은 X에 오르고 24시간만에 18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것으로, 해당 영상에 주장하는 부가티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 등 지도부의 이미지 훼손을 위해 펼친 여론 조작 활동의 일부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시민들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러시아군에 무기를 반납하라’고 종용하는 연설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AI 딥페이크 기술은 일상 깊숙히 스며들어 여론 선전 등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에도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카데미 시상식도 영상 제작 과정에 AI 활용 논란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제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에드리언 브로디도 영화 제작 과정에서 쓰인 AI 기술 때문에 수상 자격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브래디 코베가 감독을 맡고 브로디가 주연한 '브루탈리스트와' 아카데미 13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가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 후보정 과정에서 AI 기술을 사용해 예술성 평가 논란이 일었다. AI의 도움을 받은 배우의 연기를 온전한 예술적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번 논란은 영화 등 영상 예술 장르에서 AI 기술이 점차 널리 쓰이는 가운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점차 AI 활용은 보편화되는 추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월 28일 발간한 '2024 영상산업백서'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18.4%의 영상 제작 업체가 AI를 제작 과정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KBS도 지난 4일 AI를 활용한 방송 제작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KBS는 전통 공포 설화 시리즈 '전설의 고향'을 19년 만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부활시키고, 재난방송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영상 AI를 통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에 주목하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에 대한 문제도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배우와 작가들이 영화 제작에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