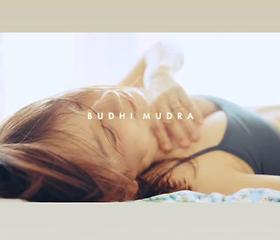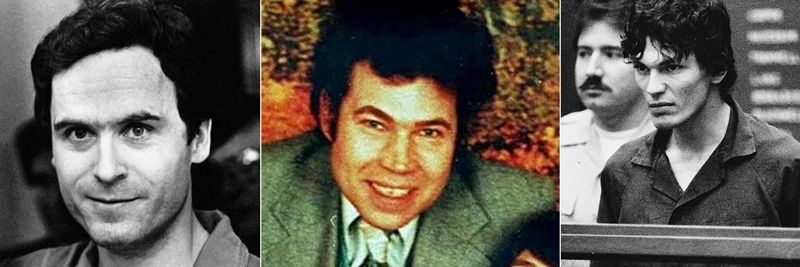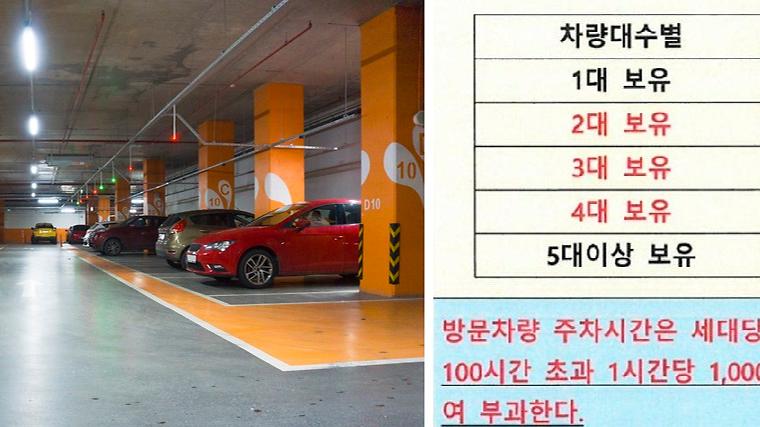지난 8일 늦은 오후, 기자의 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기자님께 드리는 부탁'. 수많은 보도자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이 메일은, 한 개인 투자자가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상장사들이 상장 전에는 주가 부양과 주주친화를 약속하지만, 막상 상장하고 나면 그 약속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기자 역시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수차례 마주친 적 있었기에 쉽게 넘길 수 없었다.
매년 많게는 80곳 넘는 기업이 새롭게 증시에 입성한다. 이들은 상장 전 간담회 자리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성장성과 비전을 강조한다. 한목소리로 주주가치 제고도 약속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장 후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는 상장사로서의 '무게'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열린 더본코리아의 주주총회에서 백종원 대표는 "주총에 꼭 나가야 하느냐고 물었다가 직원에게 혼이 났다"고 말했다. 주총은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인데도 기업의 대표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한 코스닥 기업 대표는 "연구개발만 열심히 해서 돈 잘 벌면 되는 것 아니냐, 주주까지 신경 써야 하나"는 발언을 했다가 농담이었다고 수습했지만, 무심한 인식은 그대로 드러났다.
수치로도 상장사들의 무관심은 확인된다. 지난 2년간 상장한 162개 기업 중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33곳,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상장 당시보다 주가가 낮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경영진의 태도, 주주와의 약속 이행 여부 등 '신뢰'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공모자금 활용 역시 문제다. 2022년 상장한 공구우먼은 상장을 통해 224억원을 조달했지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6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21년 상장한 리파인과 씨유테크도 공모자금의 4분의 1만 집행한 채 나머지는 쌓아둔 상태다. 상장 전 약속했던 투자계획이 상장 후엔 흐지부지되고 마는 셈이다.
상장은 흔히 기업에 '꿈'이자 '꽃'이라고 한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외부 자금을 통해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과 동시에 기업은 '공개 기업'이 된다.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경영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상장사의 '왕관'을 쓰기 전에 그 무게를 먼저 고민해 볼 때다.
hipp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