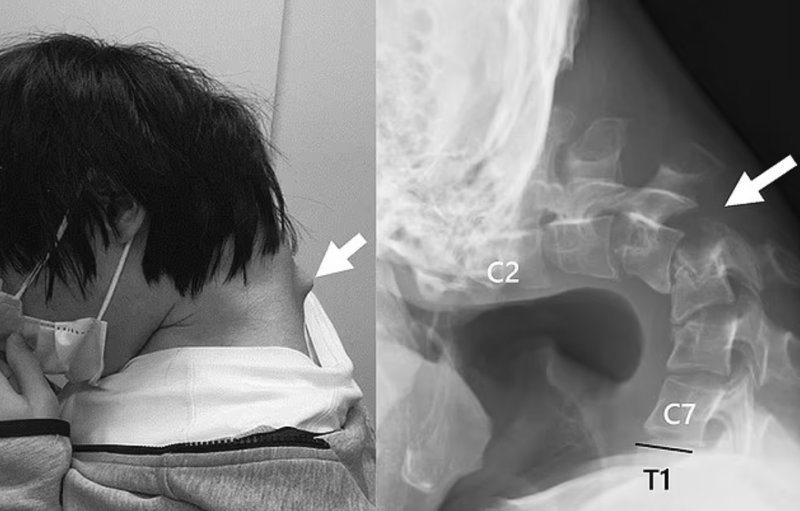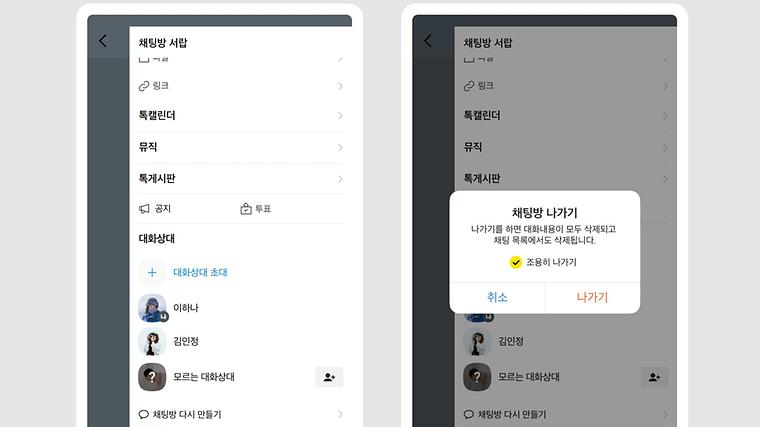20일 코스콤CHECK에 따르면 올해들어 4월 18일까지 자본성증권 순발행 규모는 5조9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본성증권 순발행 규모는 2022년 3조9102억원, 2023년 2조128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 18조2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9배 가까이 뛰었다.
자본성증권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고금리 상황은 굳어진 상황이다. 기존 1~2% 수준의 저금리를 3~4% 이상의 비교적 높아진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 기업들은 이자비용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셈이다.
CJ CGV는 이달 29일 4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목표로 수요예측에 나선다. KB증권이 단독 대표주관을 맡았다.
해당 영구채의 신용등급은 BBB+ 수준으로 비우량채에 속한다. 회사는 금리 밴드 약 6.1% 수준(고정금리)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발행 예정일은 다음달 9일께다.
같은 날 우리금융지주는 2700억원 자금모집 목표로 수요예측에 나선다.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수요예측이 흥행할 경우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영구채의 신용등급은 AA- 수준이다. 발행 예정일은 내달 13일이다. 메리츠금융지주도 지난 3일 2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지주사가 자본성증권 발행에 집중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1월~3월 메리츠증권, iM라이프생명보험, 현대해상, 한화생명, KB손해보험 등 보험사에서도 자본성증권을 대거 발행했다.
특히 보험사가 자본성 증권 발행을 늘리는 데는 지난 2023년 도입된 자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와 K-ICS·킥스 비율이 지난해 도입됨에 따라 기존 RBC 제도 대비 요구자본이 증가하며 자본적정성 관리가 강화됐다.
발행자들로선 자본조달과 재무건전성을 취할 수 있다. 또 투자자들로선 비교적 높은 금리로 안정적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연기금 등 '큰손'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포트폴리오에 담았다. 아울러 높은 금리 이외에 연내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특성상 신종자본증권 매매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다만, 만기가 긴 자본성증권에 부여되는 조기상환권(콜옵션)은 기업의 유동성 대응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옵션부채권은 중도에 기업이 현금상환하거나 시장성 조달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단기채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영구채의 콜옵션 주기는 5년이지만 최근 들어 주기는 콜옵션 주기를 1년~3년 이내로 짧게 잡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콜옵션 개시일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으면 스텝업 조항(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적용)에 따라 이자율이 불어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