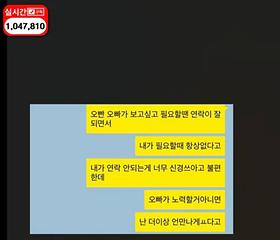부부 공동육아 모델을 찾아라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시니'
이 옛말은 부계 강화를 위한 수단
저출산시대 길잡이가 될수 있을까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시니'
이 옛말은 부계 강화를 위한 수단
저출산시대 길잡이가 될수 있을까

동물세계의 현상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한 인간의 가족제도는 모계제로부터 시작했다는 진화론이 있다. 그것은 가설 수준일 뿐, 정확하게 검증된 이론도 아니고 검증된 적도 없다. 모계제의 대표인 트로브리안드에서 야연(野硏)을 하였던 말리노브스키는 '쿠바드(couvade)'를 언급하지 않았다. 심리적 현상의 의만(擬娩)으로 번역된 것은 '쿠바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출산의 현상으로만 이해된 것이 잘못이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父兮生我 母兮鞠我)"는 정철(1537~1594)이 강원도관찰사일 때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훈민가'와 '명심보감'에 등장하며, 인용 없이 '시경'을 베낀 결과다.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는 언설은 생물학적 차원을 능가하는 다른 목적의 표현이다. 자연현상을 거스르면서 제기된 이 주장은 가족제도로 보면 부계 혈통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자녀의 친자권이 아버지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다. 부계 혈통에 배태된 지독히도 끈질긴 이데올로기의 세뇌 전략이고, 부수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윤리의식과 행동양식의 표현이다. 따라서 여성 전담의 자녀 양육이라는 문화는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에 기초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기르시니"라는 관습의 후반부를 표현한 것이 '쿠바드'다. 부인이 출산 후 몸을 추스르고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영아를 돌보는 관습이다. 육아남성(育兒男性)에 관한 내용이다. 인류학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타일러(1832~1917)의 최초 저서 '인류의 초기역사와 문명발달에 관한 연구'(1865년)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남부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의 여행객과 남미 선교사들의 보고, 일본과 중국 및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의 보고를 정리한 내용이다. 후일 '쿠바드'는 의만 현상을 중심으로 북미 인디언 사회에서도 보고됐다. 지역에 따라 의만과 육아가 달리 나타났다. '시경'의 내용을 알았던 타일러는 윌리엄 록하트라는 선교사의 중국 보고를 의심했다.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인 중국에서 육아남성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천하오(陳浩)가 만든 채회삽도인 '백묘도(百猫圖)'는 중국 서남부 82개 묘족(猫族)의 관습을 그렸고, 그중에서 낭자묘(郎慈猫)는 산옹제(産翁制)의 잔유형식으로 이해되었다. '백묘도'의 해설자는 진화론에 입각해 "모계씨족 말기에 남자 친자권의 사회공인 의례로서 백월계통(白越系統)에서 행했던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산옹'과 '낭자'는 중국 한족들의 묘족에 대한 이해방식을 글자로 표현한 것인데, 20세기의 '산옹'(출산한 아버지)보다는 19세기의 '낭자'(자애로운 사내)가 올바른 이해다. 낭자묘가 그려진 위치는 구이저우성 웨이닝(威寧)이다. '백묘도'의 내용이 전하는 낭자묘의 내용이 록하트의 보고(1861년)와 일치한다. 따라서 타일러의 의심은 오판의 결과다.
비교연구는 인류학의 기초적인 방법론이다. 동일한 관습과 행위가 여러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비교연구다. 현존하는 모계사회와 과거의 부계사회에서 공히 발견된 '쿠바드'는 현재까지의 가족연구 경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며, 사회구조로서 가족 현상 이전의 문제를 제기한다. 혈통률(rule of decent)에 내재된 현상의 탈이데올로기화가 필수적이다. 사자나 곰과 같은 동물처럼, 암수로 구분된 인간의 종족 지속은 교미가 선행조건이다. 몸의 일부분이 암수가 교미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수컷이 복수의 암컷을 상대하는 가지(可支·바다사자를 말함)는 새끼 양육이 암컷에게 전담되어 있다. 환언하면, 일부다처제의 자녀 양육이 여성 전담이라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인간 사회에서 여성의 자녀 양육 전담방식은 일부다처제의 유산일 수 있다.
새들은 부부 공동육아를 한다.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모든 행위에 우선된다. 교미 이후 떠나 버리는 수컷 사자를 보면서, 그렇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부각된다. 문화의 문제가 시작하는 동물로부터의 분기점, 즉 생물문화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함께 산다는 거주행위를 만족시키는 전제가 역할 분담이다. 남과 여의 역할 분담으로 하나의 사회 단위(social unit)가 성립하고, 역할에 따른 지위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가족 이전의 사회 단위라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사회의 시작점을 생각하게 된다. 가족 연구에 치중하느라고 그 전 단계의 과정을 소홀히 한 학계의 편향성을 후회한다. 근대와 근대화의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생각이 지배적이었음을 비판해야 한다. 인간중심주의의 확산을 너무 쉽사리 허용한 결과다. 생물학과 문화가 만나는 접합점인 공진화(共進化)의 첫 단계는 가족 이전의 사회 단위라는 문제의식을 요구한다. 생물학적 과정인 성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한다.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서양인의 눈에 기이하게 비친 남성 육아의 표현이 '쿠바드'이자 '낭자'(육아남성) 관습이다. '쿠바드'는 문화 시작의 사례로서 이해돼야 하고, 남녀 협력의 사회 단위를 가능하게 하는 지혜의 모델이다. 여성과 남성이 결합해 하나의 사회 단위를 구성하고, 그 단위가 유지되기 위한 '먹고사는' 생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육아도 사회적이어야 하니까, 사회적인 것의 실천은 공동육아가 답이다. 출산과 공동육아를 최우선적으로 설정한 사회 재편의 모델이 가능할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를 배경으로 하는 사상은 부계 혈통의 이데올로기가 확립된 이후 부계 혈통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친자권의 확인이라는 절차적 추심의 내용이다. '쿠바드'라는 거울이 저출산 현실의 핵심적 문제점을 가르쳐준다. 종족 지속을 위한 사회 단위가 부계 혈통의 가족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저출산 망국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에 입각한 연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서양의 교과서만을 추종한 결과가 나의 좌표를 상실한 상태로 귀결되었다. 졸지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선두에 섰다.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삶의 기본을 다시 정의하게 된다. 출산이 모든 현상에 우선하는 삶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는 각성이 필요하다. 남녀 역할의 불균형과 일과 육아의 공존이 실패한 결과, 생존과 멸종의 갈림길로 내몰렸다.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