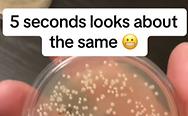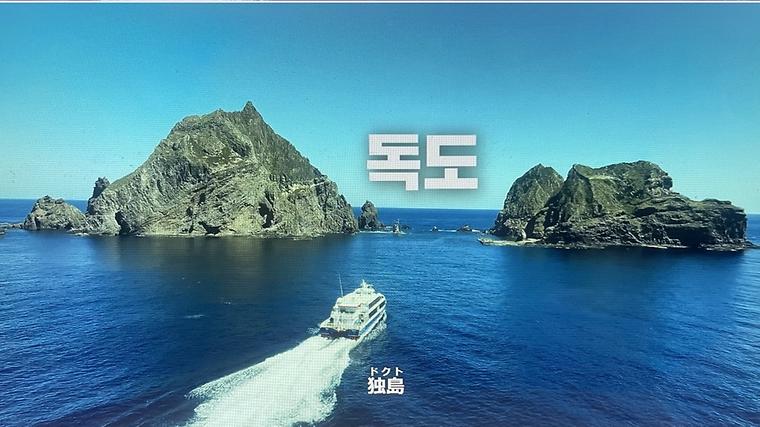평소 친구들과 운동을 즐기는 C(21세, 남)는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발목을 접질린 경험이 있었다. 병원에서 석고 고정 및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발목에 신경 쓰일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었다. 운동 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테이핑도 했으며, 예전처럼 자주 발목을 접질리지는 않았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특히 경사진 길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순간적으로 뜨끔한 통증과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은 C는 MRI 검사에서 ‘거골 골연골병변’(Osteochondral Lesion of the Talus, OLT)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거골(Talus)은 정강이뼈(경골, Tibia)와 함께 발목 관절을 이루는 뼈로, 발목의 굴곡 및 신전 운동에 관여하고 체중을 발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거골 내 연골에 국소적인 손상이 발생한 상태를 ‘거골 골연골병변’이라고 하며, 손상된 연골 조각이 마치 딱지가 덜 붙어 흔들리는 것처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체중이 실리는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원인으로는 급성 외상에 의한 발목 관절 손상, 반복적인 미세 손상의 누적, 관절 정렬의 이상, 특발성 무혈성 괴사 등이 있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에서는 운동 중 반복적인 발목 염좌가 흔한데, 특히 전외측 부위의 거골 골연골병변은 염좌 시 동반 손상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발목 관절은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 연골이 얇고 외상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병변이 장기적으로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내측의 거골 골연골병변의 경우, 단수 방사선(x-ray) 검사로도 병변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와 휴식, 물리치료 등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도 있으며, 특히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동작(계단 내려가기, 경사진 길에서의 보행 등)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병변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관절경적 미세골절술(microfracture)이다. 이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해 병변 부위를 정리한 뒤, 연골 아래 뼈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골수에서 출혈이 유도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피와 골수 세포가 굳으면서 연골 유사 조직이 형성된다.
병변이 크거나 초기 수술이 실패한 경우에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osteochondral autograft transplantation, OATS)이나, 최근에는 BMAC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등의 생물학적 치료도 시행되고 있다. 발목 염좌 이후에도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발목이 찌릿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조기에 족부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발목 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목 염좌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균형 감각 훈련과 발목 주위 근육 강화 운동(비골근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발목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윤효 원장(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 정형외과 전문의)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