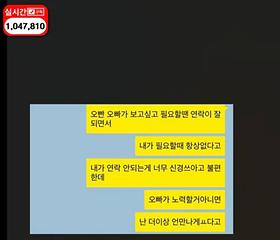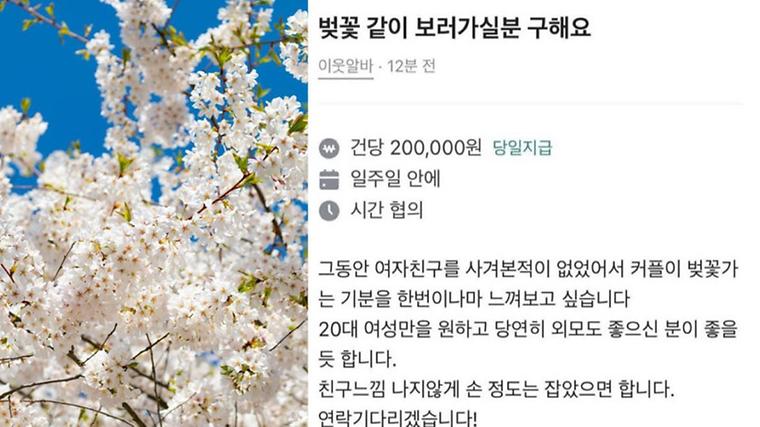7년 전 전남 강진의 어느 시골길. 김철상씨는 일찍 찾아온 초여름 더위로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있었다. 막내 딸 하은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학교에서 집까지 어린아이 걸음으로 40∼50분은 족히 걸립니다. 늘 그랬듯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그 날따라 하은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김씨는 ‘친구집에 가서 노는 중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두어 시간이 지난 뒤 평소 하은이와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의 집에 전화를 했다.
“오후 5시쯤 지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1년 전에도 초등학생 한 명이 실종된 적이 있어 다들 제 일처럼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딸만 셋인 철상씨지만 하은이는 유달리 눈에 밟히는 딸이었다. ‘미운 일곱살’이란 표현과는 정 반대로 양보심도 많았고 심성이 고운 아이였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금방 따라가 도와줄 성격이라 더 속상했다.
“길을 잃어버렸을리는 없어요. 강진이란 동네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야할 때면 공중 전화에서 긴급 버튼을 눌러 곧잘 연락도 했는 걸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갈색빛을 띤 곱슬머리의 하은이는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다. 살집이 없어 허약해 뵈긴 하지만 병치레 없이 건강한 아이기도 했다.
“하은이가 일곱살 때 없어졌으니 이제 중학생이 됐겠네요. 사춘기를 지나면 아마 제가 기억하는 신체적인 특징이 많이 없어지겠죠. 외양이 너무 많이 바뀌면 그만큼 찾기 힘들 게 될 테니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하은이를 봤다는 사람들의 제보도 많았지만 번번이 허탕이었다. 한 신문사에는 이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명의 여성이 하은이를 검은 세단에 태워갔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졌지만 그 역시 별 도움이 되진 못했다.
“신변이 자유롭게 되면 하은이가 저를 찾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생각을 바꿔 피폐해진 가정과 주변을 돌보고 있습니다. 막내딸이 돌아올 때쯤 자랑스러운 아빠가 돼 있으려고요.”
그는 ‘정신 나갔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전국 곳곳을 헤맸다. 강진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그는 일요 예배를 마치는 대로 낡은 봉고차에 라면과 물을 싣고 정처 없이 떠났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딸과 부인을 까맣게 잊었다. 2년을 그렇게 보낸 뒤 정신을 차려보니 남은 건 신용불량자 딱지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부인, 힘겨운 생활에 고달파하는 두 딸뿐이었다.
“이래선 안 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도 저에겐 소중하니까 담담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빠가 ‘강진에 있는 남포 교회 목사’였다는 건 기억할 거예요. 훗날 우리 딸이 돌아올 때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wild@fnnews.com 박하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