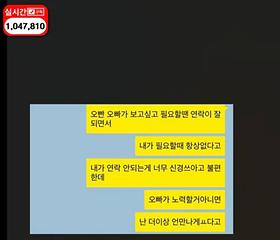외교부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드 때와 직접 비교 힘들지만 정교한 원칙적 대응 필요하단 지적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한 전면적 규제조치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한국이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른바 '화웨이 캠페인' 동참 요구가 우리만 겪는 사안이 아닌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국내 산업 조차도 기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드 사태'와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사드 사태의 경우 중국 대륙을 직접 겨냥한 안보 이슈인 데 반해 '화웨이 캠페인'은 특정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차단하라는 요청이라는 점도 다르다.
또한 사드사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반해 '화웨이 캠페인'의 경우는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우리 기업에 불똥이 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다"고 밝혀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 동참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한-미 양국은 이 이슈에 관해 지속 협의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화웨이에 대한 전면 규제에 동참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의 우려 사항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 수년간 급성장한 화웨이에 대해 미국은 일찌감치 압박을 가했다. 2012년 미국 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 업체인 ZTE(중흥통신)와 함께 미국 시장 접근을 봉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되자 최근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 직후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는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하는 국가와는 파트너로서 함께 가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중국을 상대로 '기술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도 낳았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심화되는 무역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사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중 간 경쟁에서 편을 선택하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은 있다"면서도 "사드 때와 달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정도 면에서 비교가 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화웨이와 바로 끊는다는 식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웨이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때와 직접 비교는 힘들다는 진단도 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면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부문 영업이익이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한국이 미중 간 갈등 속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사드 때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것이 미중 간에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며 "원칙을 세우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