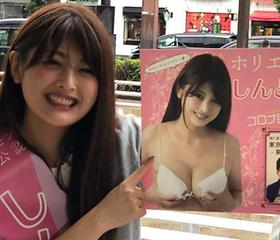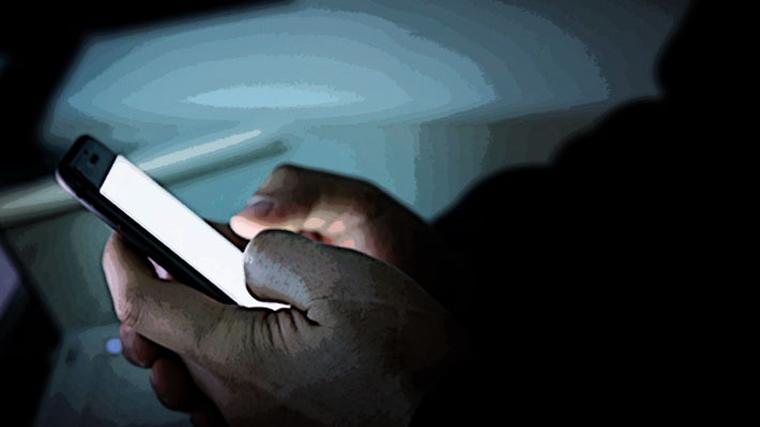금융당국의 오락가락 대출정책에 은행권은 말 그대로 '혼란의 도가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만 해도 "대출금리도 내릴 때가 됐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은행들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대출 조이기로 태도를 바꿨다.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 요구는 없을 것"이란 메시지도 전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불과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운영의 묘를 살리라'며 자율적인 대응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표면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으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개했던 전세대출을 한 달 만에 중단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도 내줬던 대출의 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다. 은행 창구에는 '대출 막차' 수요가 몰렸다.
은행들이 대출의 빗장을 열었다 잠갔다를 반복하면서 애꿎은 금융소비자들은 애가 탄다. 여기저기서 "가계대출 관리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정책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그때그때 바뀌는 '땜질식' 처방에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금융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커진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출영업에 차질이 생긴 은행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출총량 관리는 더 힘들어지고, 빗장은 고장이 날 판국이다. 금리인하기에 '대출 잡겠다'고 대출금리를 올릴 수도,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조4577억원 증가했다. 주간 단위로 나눠서 보면 이달 3주차(17~21일)에만 1조786억원이 늘었다. 이달 증가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2주차까지 늘어난 금액(3791억원)과 비교하면 폭증한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부터 늘어난 대출 신청이 2~3주의 시차를 두고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는 사이 집값 상승을 점치는 분위기는 한층 짙어졌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3월 주택가격전망지수(105)는 전월보다 6p 올랐다. 기준선(100)을 넘은 것은 1년 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돌이켜 보면 이런 혼선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매월 수조원씩 늘어날 때도 금융당국은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자, 은행권은 그해 7~8월 대출금리를 스무 차례 넘게 올렸다. 이번에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가계대출의 시작은 정책의 일관성부터"라는 은행권 관계자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수시로 방향을 바꾸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그 효과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경기침체와 탄핵정국 장기화로 나라경제가 온통 안갯속이다. '가계부채 관리만이라도 예측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blue73@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